culture sns MOURNING - 트위터로 조문하고 페이스북으로 추모한다
culture sns MOURNING - 트위터로 조문하고 페이스북으로 추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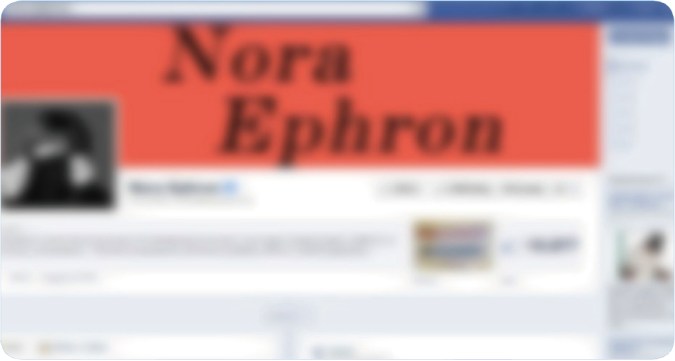
지난 수 년 간 리사 본첵 애덤스는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글로 남겼다. 처음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쓰다가 블로그를 열었고, 마침내는 트위터까지 동원하며 투병 생활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받았다. 최근 가디언지와 뉴욕타임스지가 사설을 통해 애덤스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일종의 자기치유 행위”라고 비판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 비판이 있은 뒤로 온갖 매체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편을 가르고 싸우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그동안 눈에 띄지 않던 골칫거리들을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내는지를 보여준다. 암, 불치병, 그리고 죽음 자체까지도 이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재구성된다. 이는 죽은 이를 향한 애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제 사람들은 자택 침대 위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은 다음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소셜미디어라는 거대한 세계로 옮겨간다. 트위터는 새로운 조문 경로가 되고, 페이스북 프로필은 장례식장이 됐다.
2012년 영화감독 노라 에프런이 사망하자 그녀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생전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의 회합장소로 변모했다. 이 페이지는 지금도 운영 중이다. 에프런이 쓴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페이지를 관리한다. 팬들은 에프런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그녀가 남긴 말들을 써붙인다. 영원한 내세가 현세에 존재하는 이상하고도 새로운 세상이다. 하기야 온갖 일이 벌어지는 페이스북인데 추모식이라고 해선 안 될 것이 있겠는가?
엘리자벳 퀴블러-로스가 1969년 저서 ‘죽음과 죽어감’에서 묘사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부정과 고립, 분노, 타협, 침체, 그 다음에는 결국 수용하는 단계가 찾아온다. 첫 4단계는 결코 흥미로운 과정이 아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위한 절차다. 과거에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위터와 페이스북, 텀블러가 항상 손 안에 있는 오늘날에는 세상에서 고립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쩌면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미시건대는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현대 문화의 자기애적 성질을 반영할뿐 아니라 더 증폭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10대 청소년들이 장례식장에서 한껏 멋을 부리고 찍은 ‘장례식장 셀카’가 2013년 전국적으로 퍼졌을 때만 해도 이런 주장은 옳은 듯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은 성격상의 결함을 겨냥한다기보다 세대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성인들의 눈에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도중에 사진을 찍고 ‘슬픈날’이라는 태그를 붙여 소셜미디어로 공유하는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10대 아이들이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알 길이 있겠는가? 그들에게는 소식을 전하는 최선의 방식이 사진 공유임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끼길 원한다”고 캘리포니아대 정신의학과 교수 태머라 맥클린톡 그린버그가 말했다. “페이스북은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들을 찾도록 도와준다.” 2011년 아내 알리를 폐암으로 잃은 켄터키주의 벤 누너리(34)는 자기 얘기를 공개하는 것이 때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알리가 죽기 전 이 부부는 신혼집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녀가 죽은 뒤 누너리는 3살 난 딸 올리비아를 알리 대신 서게 한 다음같은 장소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을 소셜미디어로 퍼트리면서 엄청난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 누너리는 그 사진이 그토록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감사했다. “내 생각에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기 쉽게 만든다. 단지 슬픔을 나눌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슬픔을 위로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준다.” 누너리는 말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로 애도를 표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소셜미디어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을 받는 기분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친구나 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슬픔과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위험을 수반한다.
“정말 연락을 취하고 싶은 사람은 되려 멀어질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 속 친구들과의 거리 탓에 슬픔을 극복하기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맥클린톡 그린버그가 말했다. “복잡한 문제다.” 물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 한 마디 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 소셜미디어 세상에선 이 두 부류의 성질이 더욱 극대화된다. 더 많은 응원을 받는 동시에 마음이 상할 일도 더 많아진다.”
죽은 사람을 잊기가 더욱 힘들어질 위험도 있다. 2009년에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알 수도 있는 사람’ 목록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표시된다고 불만을 표하자 페이스북측은 사망한 이용자를 추모하면서 그들의 프로필을 비활성화하는 대신 ‘추모하기’ 기능을 추가했다. ‘추모하기’된 프로필은 페이스북 서비스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유지된다. 친구와 유족들은 그 이용자의 페이지를 통해 그가 남겼던 과거의 글과 메시지, 사진을 볼 수 있다.
이런 서비스는 남겨진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주지만 도를 넘어서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13년 발매된 애플리케이션 라이브온은 “죽은 뒤에도 계속 트위터를 하게 해준다”고 공언한다. 원리는 이렇다. 사용자가 라이브온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 접근 권한을 주면 라이브온은 사용자가 그동안 남긴 트위트 메시지를 모두 읽는다. 그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에 남긴 글을 흉내내서 가상의 인격으로서 트위터를 계속한다.
인터넷은 순간적인 동시에 영원하다는 점에서 참으로 묘하다. 140자 문장이 의미 있는 감정표현으로 인정되고 2015년 이후를 상상하지 못하는 14세 아이들이 장례식 셀카를 찍어 올리는 공간이다. 동시에 장례식이 무기한으로 치러지고 죽음이 시공을 뛰어넘어 확장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온라인 추모는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종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아주 사적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외부 세계와 접촉하려 한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감정을 나눈다는 것은 인간 경험의 일부분이다. 기술은 그 경험을 보다 쉽게 만든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중동 이슈에 출러이는 亞증시…달러·유가만 '고공행진'
2'2000명 증원' 물러선 정부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
3중동서 전쟁 확산 우려에 국내 건설사들…이스라엘·이란서 직원 철수
4크로커다일 캐리어, 국내 최다 4종 캐리어 구성상품 런칭
5이스라엘-이란 전쟁 공포 확산에 환율 출렁…1380원대 마감
6노용갑 전 한미약품 사장,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으로
7KB금융,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지원…“장애인 인식 개선”
8SK하이닉스,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와 협력…차세대 HBM 개발
9LG전자, 에어컨에 AI 탑재하니 판매량 30% ‘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