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을 외면하지 마라
1946년 9월 유럽의 대다수 지역이 폐허로 변해 연기가 피어 올랐다. 수백만 명이 쓰라린 고난과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렸다. 무시무시한 폭력과 잔인함의 무대 위로 커튼이 내려왔지만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In September 1946, much of Europe had been reduced to smoking rubble. Bitter hardship and gnawing hunger were the lot of millions. The curtain had come down on one monstrous theater of violence and cruelty only to have it rise on others.
수많은 사람이 난민 수용소(displaced- persons camps)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으며 그밖에도 수백만 명이 조상 대대로 살던 땅과 집을 떠나 떠돌이 피란민 생활을 했다. 대규모 소련군이 해방을 가져다 줬지만 강간이 만연하고 새로운 스탈린주의 독재의 악령이 포식자처럼 어둠 속에 숨어서 지치고 허약해진 민주주의를 덮칠 순간을 노렸다(waiting to pounce on the wasted, fragile democracies).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윈스턴 처칠이 취리히 대학에서 연설했다. 영국총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예언자의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assuming the mantle of the prophet). 오늘날 많이 기억되지는 않지만 예지력 충만한 연설에서 처칠은 비탄에 빠진 대륙을 논했다. “오늘 나는 유럽의 비극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는 가장 깊고 위엄 있는 쩌렁쩌렁한 바리톤의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산산조각난 유럽대륙이 나아갈 길은 “유럽 가족의 재구성(to re-create the European family)”뿐이라고 처칠은 말했다. 이질적이고 싸움을 그치지 않는 대륙 구성원들의 대통합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이런 비전을 제시한 사람은 처칠뿐이 아니었다. 그는 유럽이 재탄생하는 데는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루시어스 클레이와 조지 마샬 장군도 포함시켰을지 모른다)의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유럽 국가들은 주권의 일부를 내놓고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대 이후 그들의 생활방식으로 굳어진 이해득실의 제로섬 게임을 버리는 대신 경제통합(economic convergence)을 이루게 된다. 1943년 전세가 연합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이미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더 통합된 유럽의 스케치가 그려져 발표됐다. 프랑스 경제학자 장 모네와 로베르 슈만 외무장관 등 그 구상의 열성적 지지자들은 석탄과 철강연합 체제(framework for a coal and steel union) 마련에 착수했다. 그 체제는 라인강을 투쟁의 물줄기보다는 대륙 전체를 흐르는 공영(common prosperity)의 상징으로 만듦으로써 그 원대한 유럽통합의 첫걸음을 떼게 된다.
재해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rising out of the ash pit of disaster) 이런 영웅적인 첫걸음을 지금 떠올리는 이유가 있다. 유럽통합 프로젝트가 와해될지 모르는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지역)은 유로존(유로화 사용권)이 해체되면서 유럽통합 프로젝트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심 고소해 하는(schadenfreude) 태도가 역력하다. 신용평가 기관들(credit-rating agencies)은 재정위기를 물고 늘어지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sovereign-debt downgrade)시키며 한 나라씩 쓰러뜨린다. 지중해의 재정파탄국가들(basket cases)을 뒤로 하고 새로운 먹이감(freshly fallen game)을 찾아 알프스를 넘어 북쪽으로 이동한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사태(subprime calamity)를 방조하고 향후 10년간 미국의 부채감축 규모를 1조 달러나 틀리게 계산한 신용평가사들이다. 그들이 재정난에 몰린 국가들에게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지 판정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잠시라도 뒤로 물러나 잘못을 뉘우치는 양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요즘은 먀샬플랜과 정반대의 사악한 풍조가 지배한다. 지탱하지 못할 적자에 대한 최대한의 독선적 태도(sanctimoniousness)로 적자를 줄일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조치들을 강요한다. 수요를 고사시키는 엄격한 공공부문 긴축정책(draconian public-sector austerity)으로 경제의 성장회복을 차단하고 국채금리를 자기들 편한 대로 터무니 없이 끌어올려 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치적인 분노를 부채질한다.

그렇다고 유럽 경제위기의 실제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하지만 분명 미스터 포터(Mr. Potter, 영화 ‘멋진 인생’에서 몰인정한 악당 캐릭터)의 냄새가 난다. 현명한 모범시민이 어쩔 수 없이 방탕한 게으름뱅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인식 말이다(the prudent layaways forced to the rescue of the prodigal layabouts). 불만이 커지면서 전후 유럽(그리고 미국) 번영의 토대를 이뤘던 상호의존의 전제에서 후퇴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다윈의 진화론(Darwinian evolution)을 믿지 못하겠다고 공언하는 보수파 중 많은 사람이 분명 자연도태가 이뤄져 약한 종자가 스스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서방 문화의 요람인 그리스인들에게 ‘뒈져버려, 빨리(drop dead, and do it soon)’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인상이다.
그 결과는 볼썽사나울 듯하다. 1930년대 대공황과 비슷하게 무역이 붕괴하면서 온갖 부작용(its natural concomitant)이 따르게 된다. 실패한 협력 프로젝트의 반작용으로 반이민과 대학생들의 투쟁적인 신민족주의의 물결에 편승해 사납고 권위주의적인 민족주의가 부상하게 된다. 그런 일은 미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의 ‘화합(coming together)’ 정치가 상쟁(mutual demonization)의 정치를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스러운 재정위기의 한복판에서 잠시 떨어져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통합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지금은 엘리트의 동화 같은 백일몽이라는 조롱을 많이 받지만) 그리고 그 비전 중 무엇이 싸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 말이다(might be worth fighting to preserve).
관세 없고 국경 없는 유럽연합 창설 조약이 1957년 로마에서 체결된 건 우연이 아니었다. 단일 법률체계(single legal code)와 통합정부로 이뤄진 범유럽 제국의 야망은 아우구스투스와 하드리아누스의 로마 제국 시대부터 존재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이 야만인들의 침략으로 몰락하고 수도를 보스포루스로 옮긴 뒤 기독교도 로마 황제들은 범유럽적인 로마 카톨릭교(Romanism)를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았다. 프랑크 왕국의 왕들은 무슬림 군대의 서유럽 진출을 남프랑스 투르에서 저지하면서 로마 기독교 제국(a Roman-Christian imperium)의 옹호자가 됐다. 공식기록에 따르면 그 제국 아래 유럽의 다양한 국가와 민족이 분열되지 않은 하나의 “신도그룹(Congregation of the Faithful)”으로 뭉쳤다. 그 제국은 궁극적으로 로마 교황의 명령에 따랐다.
그 통합은 종교개혁(Protestant Reformation)으로 완전히 와해됐다. 그러나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열 이전부터 프랑스 같은 왕국들은 독자적으로 실용적인 노선을 택했다. 심지어 터키인들과 전술적인 동맹까지 맺었다. 네덜란드 인문주의자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Erasmus of Rotterdam)’의 평화의 호소(Complaint of Peace, 1521) 같은 보편적인 범유럽 평화구상(ecumenical vision of Pan-European peace)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런 구상은 유럽국가들간의 유혈투쟁이 그치지 않을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에서 탄생했다. 처음에는 소수 인문주의 지식인의 이상주의에 불과했지만 새로운 활자매체가 등장해 국경과 언어를 넘어 말을 전파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환상을 갖지 않았다. 전쟁과 상호파멸적인 경쟁에서 얻는 이익에 길들여진 국가들을 어떻게든 설득해 기독교 평화의 이름으로 범유럽 연합(a Pan-European confederation)을 구성해 국경을 허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군대의 규모가 더 커지고 가공할 살상력을 갖게 됐을 때도 그들은 궁극적으로 무장해제된 유럽(a defanged Europe)의 구상을 버리지 않았다. 지배자들은 자칭 “계몽(enlightened)” 군주라고 뻐기며 볼테르 같은 철학자를 애완 지식인(intellectual pets)처럼 곁에 거느렸다.
1795년 임마누엘 칸트가 ‘영구평화론(Proposals for a Perpetual Peace)’을 발표했다. 칸트는 프랑스 혁명으로 민중이 총알받이(cannon fodder)가 되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도래할지 모른다고 잠시나마 상상했던 사람들 중의 한 명이다. 영구평화론에서 칸트는 국민의 궁핍을 초래하는 근원은 세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는 국가들의 치열한 야망이지 그들이 공언하는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에 주목해 지금 그의 글을 읽노라면 그의 선견지명에 감탄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정말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비정한 돈과 권력의 브로커들(hard-bitten brokers of money and power)보다 철학자가 때로는 현실을 더 정확히 파악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유럽 전쟁에서 사상자가 더 늘어나고 민간인 피해(the collateral damage to civilians)가 심각해졌을 때도 이상적인 유럽 평화주의자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849년 소설가이자 프랑스 공화 민주주의(French republican democracy) 옹호자 빅토르 위고는 한 평화회의에서 처칠의 할아버지 같은 어조로 말했다.
“전쟁이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날 … 무역에 빗장을 여는 시장, 아이디어에 열리는 마음이 유일한 전쟁터가 되는 날이 온다. 유럽 대륙의 모든 나라가 개성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뛰어난 한 단위 안에 밀접하게 통합돼 하나의 유럽 동포애를 이루는 날이 온다(will be merged closely within a superior unit and you will form one European brotherhood).”
군주국들은 체질적으로 상습적인 전쟁을 단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럽연방공화국이 그 ‘단위(unit)’가 되리라고 위고는 공언했다. 20여 년 뒤 프로이센-프랑스 전쟁(Franco-Prussian War)이 일어나 프랑스 제2제정이 무너지고 독일 제2제국(the second German Reich)이 태어났다. 그 전쟁이 터지기 직전 로잔의 한 연설에서도 위고는 적극적이었다. “하나의 공화국, 유럽합중국을 만들자(Let us be the same Republic, let us be the United States of Europe).”
이같은 희망과 꿈은 제1차대전 중 독가스가 살포된 참호 속에서 군인과 민간인 희생자 수백만 명과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훗날 유럽연합을 싹 틔울 씨앗은 1920년대 처음 심어졌다. 그 씨앗의 파종자는 1946년 처칠이 찬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다. 오스트리아의 리하르트 쿠덴호프 칼레르기 백작의 특이한 이름은 그가 파괴된 ‘유럽 중부(Middle Europe)’의 다국적 심장부 출신임을 말해준다. 칼레르기 백작은 빈에 있는 자신의 본거지에서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그리고 소설가 토마스 만과 하인리히 만 같은 지식인뿐 아니라 아리스티드 브리앙,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등 프랑스와 독일 정치 지도자까지 유럽연합 구상으로 끌어들였다. 두 정치가는 미래를 위해 과거의 군비를 늘려가는 적대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made a profession of renouncing for the future their ancient).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거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의 저자인 노먼 에인절 영국 노동당 의원도 또 다른 잊혀진 공로자였다. 그도 마찬가지로 유럽 중심부의 불가피한 경제통합으로 언젠가는 전쟁이 불필요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인절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1933년 히틀러가 총통에 오르면서 그와 함께 그의 희망도 물거품이 됐다.
그렇다고 범유럽주의 선구자들의 열망이 유토피아적인 환상으로 치부되지는 않았다. 처칠의 말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쮜리히 연설에서도 옳았다.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국제연합의 전신)의 원칙들은 틀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포기한 데 잘못이 있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리고 그 뒤로 더 큰 유럽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고생스럽고 생색 안 나는 작업도 마찬가지로 행정과 전문기술 관료들이 지은 사상누각(a house of bureaucratic and technocratic cards)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사실 국가들이 특색을 잃지 않고 융합할 수 있다는 위고의 이상은 언어와 사회관습의 차이에 깊게 뿌리내린 현대판 부족적 본능(the tribal instinct)과 경쟁해야 했다. 유럽주의가 성숙해졌지만 동시에 낭만주의 운동(the Romantic movement)이 이런 차이점을 애국심의 토대로 끌어올렸다. 인종, 핏줄, 토양, 배타성의 지표들이 군벌 독재체제(warrior dictatorships)로 다시 태어나 전통 공동체의 맹목적 숭배물이 됐다. 그리고 파시즘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런 지표들은 혐오하는 외국인이나 밀려 들어오는 이민자 탓으로 자신들의 불행을 돌리려는 사람들에게 거의 신비로운 마법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한다. 너무 힘들 때는 관세의 높은 장벽과 이민을 막는 담장이 둘러쳐진 부족 진지로 물러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만 구미 양쪽 모두 경제와 정치 목표의 이같은 원자화(atomiza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purpose)는 막아야 한다. 그래야 분노를 표출하는 국민과 전투적인 태도가 일상화된 깊고 어두운 시기로 또 다시 빠져들지 않는다.
좋든 싫든 우리 모두 바다와 대륙을 너머 하나로 얽힌 공동 운명체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어느 때보다 그런 특성이 강해졌다. 우리 모두 훼손돼 가는 지구를 살려야 하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우리는 중국인 채권자든, 미국인 채무자든, 그리스 파산자든, 독일인 은행가든 한 가족처럼 연결돼 어려움을 겪는다. 등을 돌리는 건 해결방안이 아니다. 언젠가 역사의 장난(the mischief of history)에 칼을 찔릴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다. 약자를 물 속에 가라앉게 버려두면 나머지 모두 헤엄쳐 나가기가 힘들어진다.
영국 시인 존 던의 말을 새겨듣는 편이 좋다. “사람은 누구도 외떨어진 섬이 아니다. 그 자체로 전체가 아니다. 사람은 모두 대륙의 일부분이다. 만일 그 흙이 파도에 씻겨나가면 유럽대륙은 줄어든다. 마치 반도가 파도에 깎여나가듯이. 누군가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깎아나간다. 우리 몸도 인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죽어 종이 울리는지 묻지 마라. 바로 너를 위해 울리는 것이니(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every man is a piece of the continent ... If a clod be washed away by the sea, Europe is the less, as well as if a promontory were ...; any man’s death diminishes me, because I am involved in mankind, and therefore never send to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thee).”
[필자는 영국 역사가다.
번역 차진우]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갓 잡은 갈치를 입속에... 현대판 ‘나는 자연인이다’ 준아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21/isp20251121000010.400.0.jpg)
![딱 1분… 숏폼 드라마계 다크호스 ‘야자캠프’를 아시나요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09/isp20251109000035.40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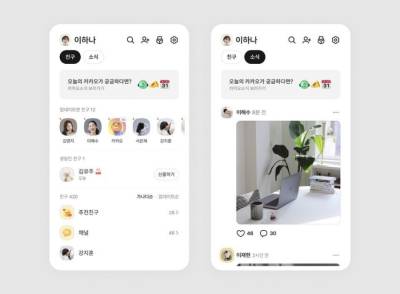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李대통령, 부처별 업무보고서 “무슨 폭탄 떨어질까 생각하지 말라”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팜이데일리
이데일리
일간스포츠
[단독] 박나래, 결국 입 열었다 "절차에 맡긴다"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LG 구광모의 특명…"CEO가 AI 전환 액셀 밟아라"[only 이데일리]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국민연금 외환시장 역할론 시험대...새 이사장 첫 회의서 환율대응 논의[마켓인]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심운섭 그래피 대표 “글로벌서 러브콜 쇄도…내년 수익개선 본격화”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