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호 교수 “동네 병의원이 대학병원 의료정보 쓸 수 있어야” [이코노 인터뷰]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는]③ 윤건호 서울성모병원 교수
“데이터 한 곳에”…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사업 참여
1차 의료기관서 3차 의료기관 의료정보 활용 기대↑
“환자가 치료 결정 개입해야…치료 성과도 확대될 것”

정부가 2년 전 시범 개통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얘기다. ‘마이헬스웨이’로도 불리는 이 사업은 병의원에 분산된 의료정보를 환자가 직접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건의료 분야에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원한다면 환자가 보험이나 플랫폼 기업 등 민간 기관에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윤 교수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별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첫 번째 목표는 환자들이 받을 치료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가 병의원을 옮기거나 새로운 의료진을 만나면 기존 진료기록을 따로 전송해야 했는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이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여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수백 장에 달하는 진료기록을 서면으로 뽑아올 때가 있다”며 “환자 한 명에 쓸 수 있는 진료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 방대한 의료정보를 빠르게 살펴보기가 만만찮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병의원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다른 기관과 전혀 공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다른 병의원에 전송할 수 있다. 윤 교수는 “이 과정에 환자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자신의 의료정보이지만, 소유와 관리의 주체는 병의원인 탓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환자가 의료정보를 직접 소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무슨 약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 병의원마다 별도로 관리된 의료정보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산업적인 측면 외에도 환자의 삶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윤 교수는 환자가 의료정보게 쉽게 접근하면 치료 성과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가 의료진과 치료 목표, 달성 방법을 협의하며 치료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윤 교수는 “해외의 여러 보건의료 기관은 환자가 치료 결정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속속 내놓고 있다”며 “환자가 치료 결정에 개입하려면 의료정보가 있어야 하며, 특히 환자가 오랜 기간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만성질환의 경우 의료정보 개방의 효용이 클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내분비내과 교수로 하루에도 수십 명의 당뇨병 환자를 만난다. 대다수가 1형 당뇨병이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어 별도의 처지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이들은 당뇨병 환자의 20% 정도로 상급 종합병원을 찾는다. 나머지 80%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증상을 관리한다.
윤 교수는 당뇨병 환자의 대다수를 관리하는 1차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 단계의 질환이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게 관리해야 환자의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윤 교수는 “중증 질환자가 지출하는 의료비용이 전체의 50% 이상”이라며 “중증 질환자를 줄이는 것이 의료비용을 줄이는 데도,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여기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교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자리 잡으면 1차 의료기관에서도 2, 3차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지식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1차 의료기관이 3차 의료기관의 방대한 의료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 교수는 “3차 의료기관은 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재산권(IP)을 생산하고, 1, 2차 의료기관은 이를 활용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1, 2, 3차 의료기관이 분업할 수 있는 틀이 될 것”이라며 “높아지는 의료비용과 짧은 진료시간 등 의료현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4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첫 번째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에는 두 번째 시범 사업이 시작됐고, 여기에는 1000곳의 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윤 교수는 “상급 종합병원이 이런 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3차 의료기관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 의료정보가 흐르는 구조가 가능해진다”며 “1차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의원만 호응한다면 빠르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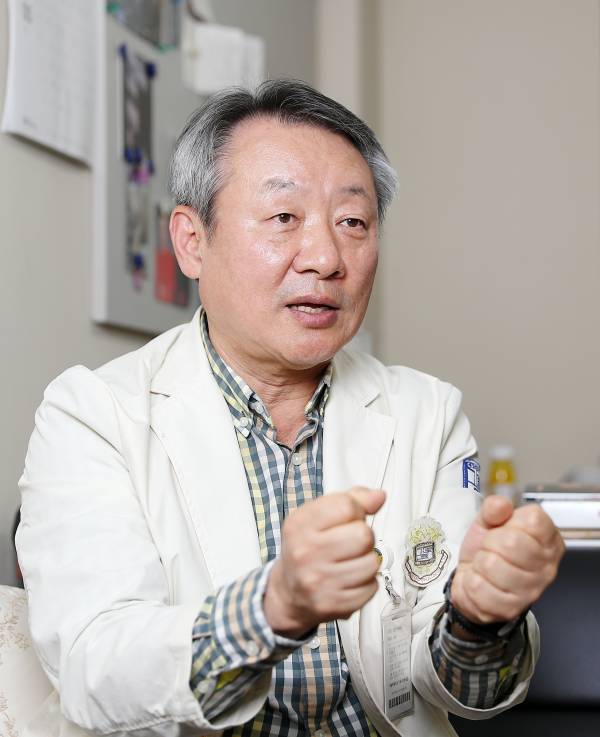
윤 교수는 “의료정보를 정제해줄 중간 다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10분가량의 진료로 의료진이 환자의 의료정보 리터러시를 키울 수는 없다”며 “금융정보처럼, 민간 기업이 의료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이런 역할을 맡을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건강관리, 질병예방을 위해 상담이나 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료적 판단이나 진단은 제공하지 않는다. 네이버와 카카오, 유비케어, 닥터다이어리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윤 교수는 “의료진에게도 적절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진이 중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하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뜻이다. 윤 교수는 “예를 들어 한 의료진이 환자의 외과 진료기록을 확인했을 때 관련 정보가 분류에 따라 그래프로 제공되는 등 활용하기 쉽게 정돈돼야 한다”며 “다양한 서비스 모델은 물론 성공 모델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케이뱅크서 67개사 대출 상품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2수협은행, 전 영업점 대상 ‘펀드판매 실태 점검 및 교육’ 나서
3현대모비스, 인도에 통합 R&D 센터 개소…글로벌 기술거점 도약
4최여진♥김재욱, 6월 결혼식인데…"다시 생각해" 왜?
5우리은행, 발달장애인 작품 ‘WON 아르떼 갤러리’ 리뉴얼 오픈
6대통령실, 이번엔 세종 가나…아파트값 벌써부터 '들썩'
7김태한 경남은행장, 취임 후 첫 행보...17개사 스타트업 대표와 만났다
8이제 비빔면 제철인데...팔도, 14일부터 가격 올린다
9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하는 ‘봄꽃축제’…“편리한 이동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