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행이 뒷짐지면 국민경제만 골탕
| |
금리와 통화량 조절을 통해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의 조화를 이루는 균형점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금융이 실물 부문에 미치는 경로와 효과가 다양하게 얽히고설키기 때문이다. 경제 규모가 확대돼 금융자산이 늘어나면 동시에 금융부채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바뀌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충돌시키게 한다. 예컨대 현금성 자산을 잔뜩 쌓아둔 대기업은 금리 인하가 못마땅하지만, 부채가 많은 중소기업이나 가계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한다.
|
둘째, 유동성을 늘려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유동성 팽창이 일시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하지만, 많이 풀린 돈이 물가를 압박해 금리가 종전보다 상승하는 일이 잦아졌다. 금리가 실물경제 활동보다는 화폐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른바 ‘깁슨의 역설(Gibson’sparadox)’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돈을 많이 풀어도 물가가 안정되는 까닭은 상품의 세계적 공급 과잉 현상이 깊어진데다, 유통 단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실물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FPI) 자금이 빈번하게 유·출입되면서 금융시장 나아가 실물시장까지 흔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초 경제 여건의 변화보다는 외국인들 움직임에 따라 채권·주식·외환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금융 부문이 경제 성장, 물가, 고용, 국제수지 같은 거시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면 실물과 금융의 괴리로 말미암은 차익거래 기회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정책 오류에 따르는 실물과 금융의 괴리를 틈타 초과이익을 노리는 ‘금융약탈자’들이 24시간 내내 지구촌 곳곳을 헤집고 다니고 있다.
이처럼 금융과 실물이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과거와 같이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삼는 통화관리는 경제순환에 장애를 일으켜 국민경제를 망칠 수 있다.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도 또 다시 고민하는 선진 경제권 중앙은행들의 모습을 보자. 그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인가? 멍청하기 때문인가?사실 그들은 지옥문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더 깊이 고뇌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금융 부문의 변화가 실물 부문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섬세한 이해와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앙은행이 우왕좌왕하거나, 뒷짐 지고 있으면 국민경제는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결단력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숨가쁘게 변해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장장 14개월 동안 묶어뒀다가 겨우 한번 내렸다. 이런 무책임과 무능력이 다시는 반복되질 않길 바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Klout
Klout
섹션 하이라이트
섹션 하이라이트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 모아보기
- 일간스포츠
- 이데일리
- 마켓in
- 팜이데일리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 예예, 미워할 수 없는 ‘킹’ 유발자 [IS인터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3/11/isp20250311000307.400.0.jpg)
![인터스텔라 한 편 뚝딱... 집에서 보는 ‘실감나는 우주’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3/16/isp20250316000120.40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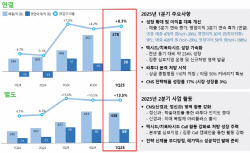


![[알림] 제3회 IS 스포츠 마케팅 써밋 아카데미 23일 개강](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17/isp20250417000481.168x108.0.png)




![[단독]뛰어난 운용 성과...‘30조’ 행정공제회 허장CIO 연임 성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2200771B.jpg)
![[마켓인]디지털자산 규제 관심 커지자…일본에 쏠리는 관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2100968T.jpg)
![[단독]국민연금, 한화에어로 유증 문제제기...비공개 대화기업 지정 논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2100967T.jpg)
![[마켓인]중동 진출 '교두보' UAE 알 나세르 홀딩…韓과 협력 강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2100959T.jpg)

![[동물실험 폐지 명암] 멥스젠 생체조직칩, 전세계 유일 ‘全과정 자동화’③](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2200397T.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2차 경선 진출…"국민께 감사"(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팜이데일리
이데일리
팜이데일리
JTBC와 분쟁에도..‘불꽃야구’ 첫 직관 전석 매진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복제폰 피해 가능성은 낮지만… SKT 유심 해킹, 전면 조사 불가피(종합2보)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뛰어난 운용 성과...‘30조’ 행정공제회 허장CIO 연임 성공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비만약 새 시대 열린다…저분자화합물 개발 성공, 한국선 일동유노비아 선두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