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더듬 치료하려면 앵무새에게 물어봐

듀크대 연구팀은 음성을 학습하는 새들의 두뇌 부위를 6년간 연구했다. 소리를 듣고 모방해 발성법을 배울 수 있는 꾀꼬리 등의 명금류와 앵무새 같은 종류다. 그 뒤 그것을 인간의 두뇌와 상호 비교했다. 그 결과 새의 발성과 관련된 특성을 나타내는 ‘수십~수백 개’ 유전자가 인간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듯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거기에는 사람과 새 모두에게서 음성학습 능력을 관장하는 듯한 한 두뇌부위의 50개 유전자도 포함된다.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 발성과 운동신경 기능과 관련된 내부회로와 두뇌영역 연구를 위한 잠재적인 모델로 명금류 등 기타 음성학습 능력을 갖춘 동물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운동신경과 언어장애 분야의 숙제는 적당한 동물 모델의 개발이다.” 현재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유전체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박사후 과정 연구원인 논문 공동 작성자 안드레아스 페닝의 평가다. 그는 “음성을 제대로 모방해 적절한 연구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유류는 없다고 말한다. 명금류가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알고 보면 소음을 일으키는 문제에선 인간도 이 새들과 아주 유사하다. 예컨대 어릴 때 발성법을 배우면서 둘 다 옹알거린다. 그리고 인간과 새 모두 말더듬 같은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유전자, 회로 그리고 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의 바탕을 이루는 메커니즘 일부를 파악하는 데 명금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페닝이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사람의 말더듬 치료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연구는 기초과학 측면에서 흥미롭다. 누군가에게 특정 언어기능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시스템이 손상됐는지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발성·언어·청각 협회 연구원인 낸 번스타인 래트너의 평가다(연구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치료는 분명 이 연구와는 거리가 먼 미래의 일이다. 이 연구에서 치료법이 개발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른다.”
어쨌든 이 연구는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기원을 조명한다. 인간과 음성학습 능력이 있는 조류가 3억1000여만 년 전 같은 조상에서 뻗어 내려왔다는 이전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음성학습 그리고 언어는 인간을 하나의 동물 종으로 규정 짓는 특성”이라고 페닝이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 능력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통찰할 수 있게 해준다.”
- 번역 차진우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Klout
Klout
섹션 하이라이트
섹션 하이라이트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 모아보기
- 일간스포츠
- 이데일리
- 마켓in
- 팜이데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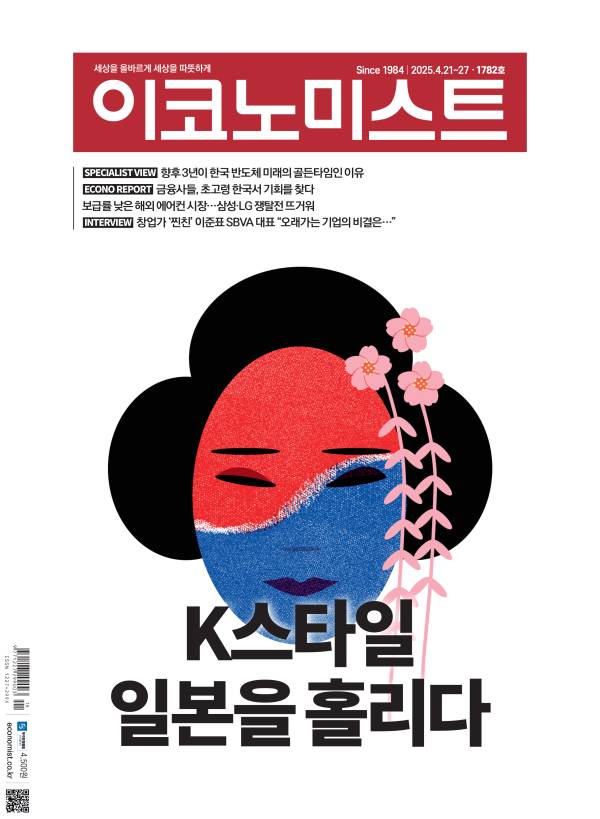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 예예, 미워할 수 없는 ‘킹’ 유발자 [IS인터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3/11/isp20250311000307.400.0.jpg)
![인터스텔라 한 편 뚝딱... 집에서 보는 ‘실감나는 우주’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3/16/isp20250316000120.400.0.jpg)









![[알림] KGMA '트렌드 오브 4월', K팝 솔로·트롯 부문 투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24/isp20250424000128.168x108.0.png)




![[마켓인]3분만에 완판된 일본 신칸센 토큰증권…비결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2500919B.jpg)
![[마켓인]“베타값 왜 수입 하나”…공정가치 평가, 기준 마련 시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2401409T.jpg)

![[VC’s Pick]똑똑한 AI에 투자 쏠려…“효율 챙기고 가설 세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2600229T.jpg)
![美3상 성공에 HK이노엔, 비만약 신기술에 인벤티지랩 ‘상한가’[바이오맥짚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2500328B.jpg)
![[단독]'동물실험' 강자 HLB바이오스텝, 건설면허까지 딴 이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2501060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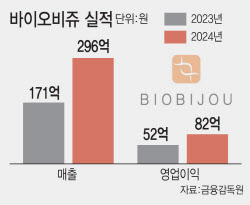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벌써 다섯 번째"… 박효신, 사기혐의로 또 피소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일간스포츠
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손흥민 또 결장, 이대로라면 '대기록' 무산 위기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트럼프 “한국 군사비 수십억달러…관세 협상과는 별도”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3분만에 완판된 일본 신칸센 토큰증권…비결은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美3상 성공에 HK이노엔, 비만약 신기술에 인벤티지랩 ‘상한가’[바이오맥짚기]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