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베트남이 경제위기설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곧 신청할 것이란 흉흉한 소리가 나온다. 만약 베트남이 경제위기에 빠진다면 주변 신흥개발도상국들도 함께 휩쓸릴지 모를 일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가 그랬다.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인도네시아·필리핀·홍콩 등을 거쳐 끝내 한국에까지 상륙했던 뼈아픈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베트남은 올 들어 4월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물가상승률도 20% 선에 육박했다. 주가는 50% 급락했다. 시중 실세금리는 20%대로 올랐고, 부동산 값은 2년 전 최고가에 비해 20∼30% 떨어졌다. 베트남펀드에 한국 자금이 1조원 이상 투자된 점을 감안하면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선 여간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베트남 위기설에 불을 지핀 곳은 일본 다이와증권이다. 이 증권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의 물가와 무역수지 흐름을 감안할 때 수 개월 안에 IMF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세계은행(IBRD)도 IMF 구제금융까진 언급하진 않았지만 베트남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베트남이 실제 경제위기에 처하고 IMF 관리체제로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무역수지 적자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설비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입 때문이다. 게다가 베트남은 산유국으로 석유를 내다팔고, 쌀과 커피 등 농산물도 수출하는 나라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값 상승의 혜택을 보는 나라로 꼽힌다. 베트남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최근 기준금리를 연8.75%에서 12%로 올리고, 예금금리 상한도 12%에서 18%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통화안정증권도 20조 베트남동(약 1조2000억원)어치나 발행했다. 성장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경제의 안정을 꼭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베트남의 단기 외채비중은 현재 9%에 불과해 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50% 이상)보다 안정적이다. 최근 주가가 급락하지만 아직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조짐은 없다. 베트남 증권 당국은 현재 증시 안정대책을 마련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되는 상황이 오면서 신흥시장 전반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딘가 약한 고리부터 끊길 가능성이 있고, 그 희생양이 베트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야 오지 않겠지만, 경제의 고통이 심해지고 그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이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로는 고유가가 주도하는 인플레이션의 확산이 꼽힌다. 역사적으로 신흥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은 인플레와 경상적자였던 적이 많다. 70∼80년대 남미 국가들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경상수지가 빠르게 악화되는 가운데 물가 통제력이 약한 국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선 유가의 연내 150달러 돌파 시나리오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설사 유가에 투기적 거품이 끼었다고 해도 상당 기간 더 부풀어 오르다가 터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과거 IT버블이나 주택버블 때도 거품 경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갈 때까지 간 뒤에야 거품이 꺼졌다는 경험론이 대두된다. 고유가는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렸다. 무엇보다 유럽연합(EU)과 주요 신흥국들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쑥 들어갔다. 인플레에 맞서기 위해 거꾸로 금리를 올리는 나라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확산된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는 선진국보다 신흥국에 더 큰 타격을 가하게 마련이다. 신흥국 자산은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경색이 다시 오면 한국에도 일정한 충격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도 올 들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고유가의 영향으로 그 규모가 올 한 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물가 불안도 가중된다. 지난달 수입물가는 1년 전에 비해 31%나 뛰었다. 이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정책을 펴고 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논리지만, 그 효과는 간 데 없고 수입물가만 더욱 자극하고 있다. 지금은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고환율 정책의 혜택이래야 일부 수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지만, 반대급부의 고통은 모든 국민이 나눠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지금 글로벌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행보는 한국보다 오히려 베트남 정부가 뛰어나 보인다.
[필자는 중앙일보 경제부 차장을 거쳐 ‘중앙SUNDAY’경제 에디터로 일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 예예, 미워할 수 없는 ‘킹’ 유발자 [IS인터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3/11/isp20250311000307.400.0.jpg)
![인터스텔라 한 편 뚝딱... 집에서 보는 ‘실감나는 우주’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3/16/isp20250316000120.40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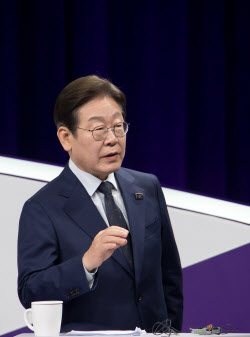


![이정후의 타격 비법, 배터박스에서의 변화 [톺아보기]](https://image.isplus.com/data/isp/upload/save/isp17449386144875.168x108.0.jpg)
![[알림] 제3회 IS 스포츠 마케팅 써밋 아카데미 23일 개강](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17/isp20250417000481.168x108.0.png)



![[EU있는경제]투자만이 살 길…PE 규제 허물고 반등 노리는 英](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800893B.jpg)
![[마켓인]대선 앞두고 STO 재점화…두각 드러내는 선두주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800885T.jpg)
![[마켓인]SK실트론 인수전에 '빅4' 사모펀드 총출동…각축전 예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800871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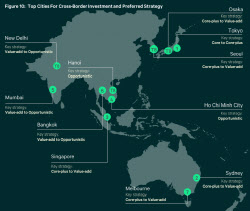

![임상에 울고 웃는 바이오株…인벤티지랩·티움바이오 '방긋'[바이오 맥짚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800203T.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선관위에 '붉은 천' 파묻은 의문의 무리들...경찰 수사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복수하겠다”…이찬원도 ‘깜짝’ 놀란 사연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14배 폭등 끝 ‘급전직하’ 상지건설…장 마감후 대규모 CB 전환 공시(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EU있는경제]투자만이 살 길…PE 규제 허물고 반등 노리는 英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필름형 '서복손' 성공 길 걷겠다"…CMG제약, '메조피' 美안착에 올인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