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투아니아출신의 보행스님은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에서 스님들의 규율을 책임지는 입승이다. |
서울 화계사에 있던 국제선원이 자리를 옮겼다. 계룡산 자락에 수행도량을 지어 무상사라고 이름 붙였다. 8년 전 화계사에서 만났던 대진스님(51)이 이곳 주지다. 지난 세월만큼이나 그의 얼굴은 부드러워져 보였다. 봄볕같이 화사한 얼굴로 이방인을 맞았다.
그의 산중 생활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전 3시 기상해 25분 동안 108배(108 bows)를 올리고, 4시부터는 아침 예불(chanting)과 참선(meditation)을 한 뒤 6시5분 아침 공양을 한다. 다시 6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울력(청소 등 노력봉사)을 하고 7시30분엔 스님들과 둘러앉아 차를 마시면서 담소한다(House Meeting).
10시부터 사시(巳時) 예불을 한 뒤 11시 조금 넘어 점심 공양을 한다. 오후엔 2차 울력을 하고 4시30분 저녁 공양을 마친 뒤 6시부터 저녁 예불을 하고 7시부터 1시간 동안 다시 참선에 몰입한다(두문불출하고 참선에 전념하는 결제[結制] 기간에는 오전과 오후 참선 시간이 더 늘어난다).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인 그는 동부 명문 보스턴대학 화학과를 졸업했다. 80년대 초 한동안 건강식품 회사에 다녔다. 그러나 과학의 응용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과학이 두렵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고뇌가 시작됐다. 그 뒤로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세운 선(禪) 센터를 찾았고, 인도인이 운영하는 요가 수련원도 다녔다.
그러나 매 순간 자신을 옥죄어 오는 “나는 누구며 진정한 삶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풀지는 못했다. 우연히 숭산스님(1927~2004년)의 설법을 들었다. 숭산스님이 직접 세운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선방에서였다. “숭산스님은 소리가 우렁찼고, 행동도 컸으며, 그의 미국인 제자들도 한결같이 기운이 넘쳐났다”고 대진스님은 말했다. 그가 숭산스님과 나눈 첫 대화는 이랬다.
“어떻게 하면 저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네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네가 도대체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거다. 그 모르는 마음이 바로 너의 스승이다. 자나깨나 ‘오직 모를 뿐’이란 화두로 정진하면 언젠가는 깨달음이 확 터질 것이다.”
대진은 1984년 한국으로 건너와 화계사 선방에서 20년 동안 수행했다. 숭산스님을 뒤따르던 그는 결국 국제선원장이 됐다. 그리고 스님이 입적하기 4년 전인 2000년 외국인 제자들을 위해 계룡산 자락에 세운 국제선원 무상사의 주지 직을 맡았다. 무상사는 숭산스님이 한국 선불교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세운 새로운 형태의 선원이다.
이곳에선 비구와 비구니, 스님과 일반신도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정진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사찰들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숭산스님은 계룡산에 따로 국제선원을 세워 자신의 가풍을 이어가려 했다”고 대진은 말했다. 무상사는 조계종 소속 사찰이 아니지만 계(戒)나 교육은 조계종에서 받는다.
그간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수행하던 외국인 스님들도 지금은 모두 무상사로 와서 수행 중이다. 현재는 최고 스님인 조실(zen master) 대봉스님, 절의 살림을 책임지는 주지(abbot) 대진스님, 스님들의 규율과 기강을 책임지는 입승(head monk) 보행스님, 지도법사(guiding teacher), 일반 스님(monk) 등 8명이 이곳에서 수행한다. 이들의 국적은 미국(3명), 리투아니아(2명), 체코(1명), 말레이시아(2명)다.

 무상사 주지 대진스님. | |
그러나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진행되는 하안거(올해엔 5월 9일~8월 5일)와 음력 10월 보름부터 이듬해 1월 보름까지의 동안거(12월 1일~내년 2월 28일) 기간에는 숭산스님이 전 세계에 세운 선센터에서 건너오는 스님들까지 합세해 40명에 이르는 식구가 무상사를 채운다.
각국에서 온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스님들 간의 일상적인 대화는 대부분 영어다. 그러나 10대발원문, 반야심경,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등 염불과 독경은 모두 한국어다.
절집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전 세계 선센터에서 보내오는 후원금과 템플스테이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숭산스님은 1972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세운 홍법원(弘法院)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한국 선불교의 씨앗을 뿌렸다.
지금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지역에 33개,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에 5개, 오스트리아·벨기에·체코·덴마크·프랑스·독일·영국·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러시아·슬로바키아·스페인 등 유럽지역에 57개, 그리고 이스라엘에 1개 등 모두 96곳의 선센터에서 수천 명의 제자가 정진한다.
대진과 대화하던 중 보행스님(48)이 불쑥 주지실로 들어섰다. 리투아니아 태생인 보행은 무상사의 입승(立繩)이다. 엊그제 공식 비구계를 받고 와서 그런지 상좌승인 대진 앞에서 눈에 띄게 몸을 숙였다. 그런 보행에게 숭산스님과의 인연을 물으니 한동안 묵묵부답이다. 얄궂게도 보행은 선승이 되기 전에도 무언극을 전문으로 하는 팬터마임 극단 책임자였단다.
보행은 옛 소련 붕괴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리투아니아가 혼란에 휩싸였던 1990년대 초 수도 빌뉴스에서 숭산스님을 처음 만났다. 한국 선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선 숭산은 1978년 폴란드에 머물면서 동유럽 포교를 시작했고, 1991년엔 직접 리투아니아 포교에 나섰다. 현재 리투아니아 공화국엔 빌뉴스를 포함해 선센터가 3곳이나 있다.
“18년 전 같았으면 붉은 적위대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보행이 말했다. “숭산스님의 설법은 강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때론 폭포수처럼 힘찼다.” 숭산의 설법에 감명받은 보행은 폴란드 바르사뱌의 도암사로 건너가 매년 결제에 참가하는 등 행자생활을 하다가 고향 카우나스에 고봉사라는 사찰을 짓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젊은 시절 보행은 구소련의 육군, 리투아니아 TV 프로듀서, 시베리아 노동자, 극단 배우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한때는 고등학교 교사생활을 한 적도 있다. 그 와중에 러시아어로 된 불교서적을 읽는 순간 한 구절이 번쩍 눈에 띄었다. “세상에 드러내 자랑하는 너 자신의 모습은 결코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이 구절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으려는 구도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재가불자 생활로는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1999년 작심하고 한국으로 건너와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8년간 머무르며 행자생활부터 시작했다. 보행의 눈빛에 빨려 드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목탁 소리가 났다. 점심 공양을 알리는 소리다. 대진·보행 스님과 함께 공양간에 들어서니 공양주 보살이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나왔다.
브로콜리와 버섯·감자를 섞은 죽, 김치, 잡곡밥이다. 절밥이 본디 맵거나 짜지 않지만 서양인의 식성을 고려해 더 싱거워진 느낌이다. 옆자리에서 함께 공양을 하던 체코 출신의 행자 원만(圓滿·23)에게 무상사로 오게 된 연유를 물었더니 “인터뷰는 안 된다”며 말을 막았다. ‘묵언수행’을 하기 때문이다.

 보행스님. | |
지난해 10월 체코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앞으로 1년간 행자생활을 한 뒤 사미계 여승(novice nun)이 되고, 몇 년간 더 수행해 비구니(nun)로 살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질문엔 입을 닫았다. 맞은편에서 공양 중이던 스웨덴 출신의 롤랜드(61)는 “은퇴한 뒤 유럽에서 줄곧 생활하다 관광비자로 한국에 왔는데 이곳이 너무 좋아 당초 계획보다 더 오래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공양이 끝나고 경내를 돌아보는 순간 젊은 외국인 남성이 눈에 띄었다. 다가가 물으니 미국 인디애나대 종교학과를 졸업한 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는 조 맥기번(23)이라고 한다.
봄방학을 맞아 한국 선불교 탐구차 무상사를 찾은 그는 주말에 열리는 2박3일 일정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템플스테이는 두 종류로 1박2일에 2만5000원, 2박3일에 5만원이다). 오늘이 이틀째란다.
아버지는 개신교도, 어머니는 유대교 신자지만 자신은 불교 신자라는 그는 숭산의 법문을 현각스님이 정리한 ‘선의 나침반(The Compass of Zen)’을 읽으면서 한국 선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현각은 현재 무상사를 떠나 미국에서 포교 중이다).
맥기번은 한국과 일본의 선불교를 나름대로 비교하기도 했다. “한국 선불교는 참선을 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등 보다 심오한 질문을 던지지만 일본 선은 모든 상념을 떨치고 오직 좌선에만 힘쓰는 시칸타자(只管打坐)를 추구하는 듯하다.” 숭산은 입적하기 3년 전 뉴스위크 한국판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선은 계단 선이다.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그러나 그것도 임제종(臨濟宗)만 그렇고, 조동종(曹洞宗)이나 황벽종(黃壁宗)에선 아예 화두 자체가 없다(묵조선)”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의 선은 형식적인 데가 많다. 참선을 할 때는 열심히, 기계적으로 하지만 일단 참선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부인도 둘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보리 달마에서 내려오는 선을 옳게 가르치는 곳은 한국뿐이다. 중국은 선방이 사라졌고, 일본은 옳게 공부하지 않는다. 한국 불교의 어깨가 무겁다.” 회교 국가인 말레이시아 출신 명안스님(50)도 한국 선불교에 푹 빠져 있다. 숭산스님과의 첫 만남이 “어쩌면 나의 카르마(業)였던 듯하다”고 운을 뗐다.
중국 화교 출신인 명안은 15세 때 영국에 건너가 뉴캐슬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셰필드대에서 MBA를 땄다. 그 후 브리티시 개스사에서 근무하다 홍콩으로 옮겨 1992년부터 다우케미컬사에서 잘나가는 금융 컨설턴트로 일했다. 그러나 “내 삶에는 늘 뭔가가 빠져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던 중 1992년 숭산스님이 홍콩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설법을 들으러 갔다. 당시 통역은 숭산을 한국군 장성 출신으로 잘못 전달했다. 이를 모르던 명안은 설법이 끝난 뒤 숭산에게 물었다. “당신은 한국군 장성 출신이므로 전시에 적군을 죽이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생을 금하는 불교 승려가 될 수 있는가?”
그러자 숭산은 대뜸 이렇게 대답했다. “부모가 필요하면 부모를 죽이고, 선생이 필요하면 선생을 죽이고, 부처가 필요하면 부처를 죽여라!(When you need your parents, kill your parents. When you need your teacher, kill your teacher. And when you need the Buddha, kill the Buddha!)” 임제선사의 설법을 원용한 숭산의 대답에 명안은 그간 자신을 옥죄던 불만의 뿌리가 쓸데없는 집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처럼 명쾌한 설명에 한동안 생각이 멍해졌다”고 명안은 당시를 돌이켰다. 불교는 영어로는 Buddhism이다. 굳이 말하자면 ‘붓다주의’다. 따라서 본질적으론 부처의 사상과 행동을 따르는 일이다. 숭산이 뉴욕 맨해튼 14번가에 세운 ‘조계 국제 선센터’의 지도법사(guiding teacher) 우광선사(66·본명 리처드 슈로브)는 선불교를 “꼭 종교라기보다는 진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방법론”으로 규정했다.

 말레이시아 출신의 명안스님. | |
유대계로 조계 국제 선센터의 행정을 책임진 잰 포템킨(57)도 “선불교는 종교도, 철학도 아니며 일정한 가치나 규범 이전의 인간 심성에 내재하는 원초적 평상심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뉴욕 등 세계 각지의 선센터에서 수행 중인 사람들 중엔 기독교도나 유대교 신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불교가 서양에 어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교 특유의 이 같은 ‘포용성’ 외에도 창조주가 없다는 사유체계가 서양의 무신론자(atheist)나 불가지론자(agnostic)들에게 먹히기 때문이다.
흔히 가톨릭에선 묵상(contemplation)을 통해 인격신인 하느님과 계속 대화하려 하지만 선불교에선 절대자를 찾는 마음까지 비우고 자신의 깊숙한 내면을 파고들어 자신의 ‘본모습(불성)’을 찾으라고 한다.
숭산이 서양인 제자들에게 “생각이 끝나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은 이유다. 그것을 찾는 과정은 길고도 험난하다. 외도선(外道禪), 범부선(凡夫禪), 소승선(小乘 禪), 대승선(大乘禪), 그리고 최고 경지인 최상승선(最上乘禪)-.
자신의 본모습을 깨닫는 확찰대오(確察大悟)의 순간은 언제쯤 찾아올까? 대진은 “대답을 찾으려는 마음마저 놔버릴 때”라며 “대답을 갈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대답을 찾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통 선원에서도 어떤 결과나 깨달음(enlightenment)을 얻으려고 화두를 잡아선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이 점은 무상사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날 아침 해가 뜨면 삼라만상이 위대하고, 나무는 초록빛이고, 하늘은 푸르게 보이면서 스스로를 이해하게 된다. 깨우칠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오직 정진하라고 가르친다”고 대진은 말했다. 그게 더 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숭산도 살아생전에 “자나깨나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로 정진한다”고 말했었다.
다시 짓궂은 욕심이 슬쩍 고개를 내민다. 앞에 놓인 반쯤 찬 찻잔을 두고 명안스님에게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명안은 그 찻잔을 슬그머니 기자 앞으로 밀었다.
다시 물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었는가? 그러자 명안은 파안대소를 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10년 후 다시 나를 찾아오라.” 10년 후에나 답을 알겠다는 말이었을까? 아니면 과거와 미래는 없고 오직 이 순간만 존재할 뿐이라는 뜻이었을까?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 예예, 미워할 수 없는 ‘킹’ 유발자 [IS인터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3/11/isp20250311000307.400.0.jpg)
![인터스텔라 한 편 뚝딱... 집에서 보는 ‘실감나는 우주’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3/16/isp20250316000120.400.0.jpg)






![김흥국, 나경원 캠프 합류…”보수 뭉쳐야 한다는 마음” [IS인터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2/27/isp20250227000441.230.0.jpg)


![김흥국, 나경원 캠프 합류…”보수 뭉쳐야 한다는 마음” [IS인터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2/27/isp20250227000441.168x108.0.jpg)


![[단독]김흥국](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900135T.jpg)
![[EU있는경제]투자만이 살 길…PE 규제 허물고 반등 노리는 英](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800893B.jpg)
![[마켓인]대선 앞두고 STO 재점화…두각 드러내는 선두주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800885T.jpg)
![[마켓인]SK실트론 인수전에 '빅4' 사모펀드 총출동…각축전 예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800871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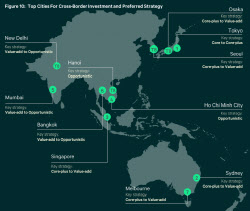
![[동물실험 폐지 명암] 투심 쏠린 토모큐브, 빅파마가 주목하는 까닭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700440B.jpg)
![껄끄러운 산부인과 검사, 자가채취로 해결…바이오다인의 야심작[편즉생 난즉사]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600355T.jpg)
![임상에 울고 웃는 바이오株…인벤티지랩·티움바이오 '방긋'[바이오 맥짚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800203T.jpg)
![美FDA인력 감축 칼바람 여파 '촉각'[제약·바이오 해외토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900112T.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충청서 압승 거둔 이재명…득표율 88.15%(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어머니, 아버지 저 장가갑니다”…‘결혼’ 김종민 끝내 눈물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충청서 압승 거둔 이재명…득표율 88.15%(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EU있는경제]투자만이 살 길…PE 규제 허물고 반등 노리는 英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동물실험 폐지 명암] 투심 쏠린 토모큐브, 빅파마가 주목하는 까닭①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