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카마나나(Kamanana)’. 카이로 외곽의 상가에 위치한 화장품 가게 이름이다. 출입구 위 샛노란 간판에 큼직하게 적혀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음악가들이 말하는 넌센스 단어다. 이집트의 유명한 가수 모하메드 푸아드가 1997년 영화 ‘오락가락하는 이스마일리아(Ismailia Back and Forth)’에서 부른 히트곡에서 따왔다. 그 영화가 크게 히트하면서 ‘카마나나’라는 단어가 대중의 의식(popular consciousness)에 깊이 새겨졌다. ‘전부’의 동의어로 볼 수 있다. “뭘 원해?” 푸아드가 노래에서 묻는다. “카마나나.”
푸아드는 그 상가 가까이 산다. 그는 상가 입구 부근의 한 식당에 앉아 사과향 물담배를 피우며 칙사 대접을 받는다. 식당 종업원들이 찾아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여자들이 살금살금 다가와 사진을 찍자고 한다. 남자들이 악수를 청한다. 푸아드는 물담배 빠는 리듬을 깨지 않고 모든 청을 차분히 들어준다(takes it all in stride, barely interrupting the rhythm of his pipe). “모하메드 푸아드는 모든 사람을 위한다(Mohamed Fouad is for all)”고 스스로 말했다.
아니, 적어도 과거엔 그랬다(Or at least he used to be). 지금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할지 모른다.
푸아드는 자신의 노래 하나하나가 드라마의 축소판(a miniature drama)이라고 생각한다. 빨리, 그리고 쉽게 소비되도록 압축됐고(boiled down for quick and easy consumption), 대중의 취향에 맞게(with a finger on the popular pulse) 만들어졌다. 영화처럼 도입부, 중간부, 종결부의 구조를 취한다. 하지만 메시지는 영화 예고편(a movie trailer)처럼 단 몇 분에 압축돼 있다. “노래는 하나의 그림을 전달한다”고 푸아드가 말했다.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이 어떤지 보여준다.” 그에게는 좋은 노래가 시대상을 그리는 예고편이다. 아니면 멋진 광고와 같다. 이집트 서민의 정서와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감을 산다(resonating with regular Egyptians).
푸아드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이집트에서 처음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을 때 그는 목청 높여 시위를 반대했다. TV에 나가 울부짖으며 시위대에게 거리를 떠나 달라고 애원했다. 그 때문에 혁명 의지에 불타는 군중의 노여움을 샀다(This earned him the ire of the revolutionary crowd). 그러나 푸아드는 여느 이집트인처럼 그때 단지 두려웠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나라가 불길에 휩싸인 듯했다(We were thinking like the country is on fire).” 결국 그도 마음을 바꿔 혁명을 받아들였다(He came around to embrace the revolution). 하지만 그 이후 자욱하게 내려앉은 안개 같은 흐릿함 속에서 그는 방향을 잃었다(he feels lost in the murkiness that has settled in since). 옛 이집트는 사라졌지만 새 이집트는 아직 형체가 잡히지 않았다. 상황이 계속 바뀌는 듯하다. 이집트인들은 흔히 “우린 흐르는 모래 위에 서 있다(we’re standing on shifting sands)”고 말한다. 푸아드 같은 주류 아티스트들은 과거 단순한 시대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 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기를 못 쓴다(the uncertainty has been wearing on mainstream artists). 이제 푸아드는 팬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하는지, 자신이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모른다. “내가 노래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그가 말했다.
지난해 2월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나자 몇몇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은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 이집트의 간판 여배우 유스라는 ‘안과 밖(Interior/Exterior)’에 출연했다. 중년 부부가 혁명으로 갈등을 겪다가 마침내 타흐리르 광장의 시위군중에 합류한다는 내용의 단편영화다. 이집트의 인기 대본작가와 감독들이 참여한 옴니버스 영화 ‘18일(18 Days)’의 일부인 그 드라마는 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다. 유스라는 당분간 혁명을 주제로 한 영화에는 출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카이로에 있는 유스라의 아파트 거실에는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유스라가 허벅지까지 빠지는 나일강 속에 서 있는 그림이다. 그녀는 두 손으로 연꽃을 감싸고 있다(She cups a lotus flower in her hands). 눈에 서린 슬픔은 격동의 이집트 역사(the country’s turbulent history)를 말해준다. 그녀의 침착한 표정에서는 혼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난 다(Her poise shows the will to overcome). “이 그림은 이집트를 상징한다.”
유스라는 군중이 처음 타흐리르 광장을 메웠을 때 이집트의 완벽한 모습을 봤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엮인 듯이(as if everyone were bound together by an invisible string) 하나로 연결된 분위기였다고 그녀는 말했다. 무바라크가 권좌에서 쫓겨나자 그 마법은 깨졌다(the spell broke).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마법에 홀린 듯한 순간이 있었다”고 유스라는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마법이 사라졌다. 보이는 건 살인, 피, 오해뿐이다. ‘피트나(fitna)’만 눈에 들어온다.” ‘피트나’는 순도를 검사하려고 금속을 가열하는 과정(the process of heating metal to find out its purity)에서 유래된 말로 ‘사람들 사이에 균열을 만든다(creating rifts between people)’는 뜻이다. 유스라는 피트나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는 코란 구절을 인용했다. 유스라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산다.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유스라는 ‘안과 밖’에서 혁명을 지지하는 인물을 연기해 찬사를 받았지만 요즘 이집트가 돌아가는 사태에 갈등을 느낀다. 그녀는 “주어진 상황에 공감이 가는 순간도 있지만 가짜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There are moments when my heart really feels for the situation, and then there are moments when I think it is false)”고 말했다. 너무도 불확실한 그 무엇에 관한 영화를 만드는 건 잘못이라고 느낀다.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을 때면 나는 앉아서 지켜본다고 늘 대답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외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황을 달리 이해하게 된다.”
혁명이 무르익자 시인부터 펑크 로커까지 모두가 혁명의 명분을 지지했다. 이집트인들의 낙서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미술관에서는 혁명미술 전시회가 열렸다. 가난한 통기타 가수 라미 에삼이 만든 저항운동 노래가 가장 인기 있다. 그는 타흐리르 광장에서 단 몇 분 만에 인기 구호와 일부 즉흥적인 가사로 노래를 만들었다. ‘아프로팝 월드와이드(Afropop Worldwide)’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음악 저널리스트 배닝 아이어는 당시 ‘민중의 힘(people power)’을 노래한 음악이 전성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자유로움의 표현으로 노래를 만들었다(You could record a song that was an expression of being free). 그게 당연하다고 느꼈다(It felt right).”
대다수 스타들은 어쩔 수 없이 시류에 휘말렸다. 여배우 넬리 카림은 “처음엔 아티스트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녀는 사회적 의식을 다룬 2010년의 히트 영화 ‘678’에서 주연을 맡았다). 거부하다가는 앞날이 위태로워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There were also career concerns on the line). 가수 타메르 호스니는 타흐리르 광장에 처음 갔을 때 무대에 뛰어올라 군중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며칠 뒤 그가 사과하려고 했지만 군중이 외면했다. 그 일로 그의 명성에 큰 금이 갔다(dealing a massive hit to his reputation).
푸아드는 무바라크의 두 아들(알라와 가말)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동기를 의심 받았다. 유스라도 자신의 성공에 발판이 된 혁명 전의 실세들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of being too close to the old power structure)로 비난을 샀다. 문화부의 영화 담당 국장을 지낸 작가 겸 프로듀서인 타메르 압델모네임은 무바라크에게 든든한 줄을 대고 있었다. 그의 부친이 무바라크의 공보비서였고 장인이 무바라크의 변호사였다.
그는 혁명을 거리낌 없이 경멸했다(had no qualms about voicing his disdain for the revolution).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는 TV에 출연해 “타흐리르 광장의 시위는 헛소리(Tahrir is shit)!”라고 조롱했다. 그 뒤로 그는 자리에서 쫓겨났다. 영화업계가 그와 일하기를 꺼리자 그는 독자적인 토크쇼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인기 높은 대본작가 타메르 하비브는 타흐리르 광장의 시위에 서둘러 참여했다. 그는 거기서 영감을 얻어 유스라가 출연한 단편영화 ‘안과 밖’의 대본을 썼다.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하비브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다. 작가로서 대상을 외부에서 보는 데 익숙한 그는 현재 그 드라마 속에 깊숙이 휘말렸다(Accustomed, as a writer, to viewing his subject from the outside, he now finds himself embroiled in the drama). 그런 시각으로는 대상을 잘 볼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시야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흐려지는 듯하다. 현재 작업 중인 비정치 시트콤(the apolitical sitcom) 대사도 쓰기 어려워졌다.
지난해 12월 어느 늦은 밤, 하비브는 나일강이 내려다 보이는 책상에 앉았다. 타흐리르 광장의 새로운 시위와 폭력이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총선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그들의 지배 아래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한편 무바라크를 몰아낸 민중 운동은 분열됐다(The movement that ousted Mubarak has fragmented). 종종 새 정치인들과 옛 인물들을 구별하기 불가능할 때가 있다. 외국의 개입이니 반혁명이니 하는 소문이 떠돈다(There are rumblings of foreign interference, and of counterrevolution). 군사정권은 권력을 강화시키는 듯하다. 하비브는 “타흐리르에서 일어나는 일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과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거기에는 완전히 다른 견해가 있다.
자신의 내면에서도 생각이 엇갈린다(Even between you and yourself, you may have conflicting opinions). 미칠 지경이다(It can drive you mad).”
하비브는 어린 시절 고전 이집트 영화를 볼 때 화면에 흐려진 부분이 있었다고 돌이켰다. 1952년 이집트 혁명 후 네거티브 필름에서 지워진 파루크 왕의 초상화였다. 당시 가말 압델 나세르와 군 장교들이 왕정을 무너뜨리고(overthrew the monarchy), 영국 식민지 권력을 몰아내고(drove out the British colonial powers), 많은 이집트인을 빈곤에서 구했다(lifted masses of Egyptians out of poverty). 하지만 그들은 군부 통치의 씨앗도 뿌렸다(They also planted the seeds for military rule). 수많은 영화광처럼 하비브도 혁명을 주제로 한 좋은 영화가 나올 때까지 수년이 걸렸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왕정은 흑팀이고 혁명이 백팀이라고 생각했다(For a very long time we thought the kingdom is the black team and the revolution is the white team).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자 흑팀도 백팀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떤 면에서는 둘 다 회색이다(Both of them are gray, in a way).”
이집트의 연예산업은 매년 라마단 시즌을 겨냥해 가장 좋은 작품을 준비한다. 가족들은 하루 종일 금식한 뒤 저녁에는 TV 앞에 모여 프라임타임 드라마와 쇼를 본다. 중간중간 광고가 시차를 두고 편성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돌려가며 볼 수 있다(with commercial breaks staggered so viewers can switch between shows). 그런데 지난해 여름의 작품들이 근래 최악으로 평가됐다. 시청자들은 혁명으로 가득한 줄거리를 비웃었다. 데일리 뉴스 이집트의 예술문화 담당 편집자 조셉 파힘은 “혁명 후 나온 모든 것이 순진해 빠졌다(Everything that came after the revolution just seems naive)”고 말했다. 그는 이집트의 가장 신망 높은 감독 중 한 명인 유스리 나스랄라가 만든 작품처럼 몇 편의 영화는 괜찮지만 주류 아티스트들이 어려운 시절을 따라잡지 못한다(mainstream artists have failed to keep pace with the difficult times)고 생각한다. ‘민중의 힘’이 만들어 낸 초기의 창의성도 이젠 고갈된 듯하다(Even that initial burst of “people power” creativity has seemed to dry up). “혁명 예술이 중단된 듯하다(I think there is a break in revolutionary art).”
혁명 가수라고 하면 모하메드 무니르가 일순위로 꼽힌다. 그는 ‘이집트의 목소리(the Voice of Egypt)’로 불린다. 그는 오랫동안 반체제 음악을 추구했다. 이집트를 아름다운 여성에 비유한 그의 노래 ‘에자이(Ezay)’는 에삼의 통기타 노래와 쌍벽을 이뤘다. 무니르는 그 노래를 2010년 가을에 지었다.
무니르는 모자 달린 운동복과 플라넬 슬리퍼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투쟁을 직접 겪는 데서 좋은 노래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음악에서 반복되는 주제 때문에 도시나 사막을 혼자 헤매며 답을 찾는다. 그 답을 찾는 게 임무라고 느낀다. “진정한 아티스트는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멀리 봐야 한다(The true artist is the one who sees further than the people see). 낙관적이라야 한다. 내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there is a calling for me to explain what happened briefly).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했을까? 혁명 도중에 어떻게 노래하고 춤출 수 있을까?”
무니르는 현재 앨범을 만드는 중이다. 하지만 그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그는 “고민이 많다”고 인정했다. “매일 다른 답이 나온다(Every day I have another answer).” 그는 격동에 휩쓸린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집트인들은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하다(More than anything, the Egyptian people need psychological help)”고 그가 말했다.
예술 비평가이며 카이로의 아메리칸대학 인문사회과학대 학장인 브루스 퍼거슨은 그 과정을 심리치료에 비유한다. 그는 진정한 투쟁은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후에 시작된다(real struggle begins after a person finds his voice)고 말했다. 이집트에선 그 투쟁이 국가적인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펼쳐진다(In Egypt, that struggle is playing out against a backdrop of national trauma). “예술 작품은 오랜 사색에서 나온다(Works of art come out of some sort of contemplation)”고 그가 말했다. “진짜 좋은 작품은 문화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 혁명 후는 혼란 상태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새로 얻은 목소리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What are you going to say with your new voice)?”
저명한 영화감독인 나스랄라는 혼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에 대처했다. 혁명을 주제로 한 그의 영화는 대본이 없다. 쓰면서 찍고, 찍으면서 쓴다.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가장 힘든 경험이다(It’s one of the toughest experiences I’ve been through in my life). 대개 대본을 쓸 때는 답이 필요하다(More often than not, when you write scripts you need answers).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더 많이 제기한다(And the period we’re in right now raises more questions than it provides answers).”
나스랄라의 경험은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들린다. 최근 다큐멘터리 장르가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 인기 있는 다큐멘터리 제작자 제하네 누자임이 타흐리르 광장에서 체포되자 세계 언론이 들끓어 정부는 그녀를 36시간 만에 풀어줬다. 누자임의 제작팀은 시위가 시작될 때부터 타흐리르 광장에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찍었다. 지난해 12월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카이로 작업실은 매우 바쁘게 돌아갔다. “이런 시절에 예술이 번창한다(Isn’t it in these kinds of times when art flourishes)?”고 그녀가 말했다.
누자임이 컴퓨터로 가득한 방으로 뛰어갔다. 너댓 명이 8조 바이트나 되는 녹화 장면을 눈이 빠지게 들여다 보고 있었다. 편집자 크리스토퍼 데 라 토레(29)는 혼자 맥북 앞에 앉아 예고편을 만들고 있었다. “찍은 분량이 너무 많다(There’s so much footage). 이 영화는 끝이 없다(The film is kind of an endless process). 도대체 어디서 끝이 나는가(Where does the film end)?”
번역 이원기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Klout
Klout
섹션 하이라이트
섹션 하이라이트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 모아보기
- 일간스포츠
- 이데일리
- 마켓in
- 팜이데일리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 예예, 미워할 수 없는 ‘킹’ 유발자 [IS인터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3/11/isp20250311000307.400.0.jpg)
![인터스텔라 한 편 뚝딱... 집에서 보는 ‘실감나는 우주’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3/16/isp20250316000120.400.0.jpg)






![김흥국, 나경원 캠프 합류…”보수 뭉쳐야 한다는 마음” [IS인터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2/27/isp20250227000441.230.0.jpg)


![김흥국, 나경원 캠프 합류…”보수 뭉쳐야 한다는 마음” [IS인터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2/27/isp20250227000441.168x108.0.jpg)


![[단독]김흥국](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900135T.jpg)
![[EU있는경제]투자만이 살 길…PE 규제 허물고 반등 노리는 英](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800893B.jpg)
![[마켓인]대선 앞두고 STO 재점화…두각 드러내는 선두주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800885T.jpg)
![[마켓인]SK실트론 인수전에 '빅4' 사모펀드 총출동…각축전 예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800871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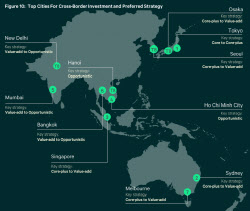
![[동물실험 폐지 명암] 투심 쏠린 토모큐브, 빅파마가 주목하는 까닭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700440B.jpg)
![껄끄러운 산부인과 검사, 자가채취로 해결…바이오다인의 야심작[편즉생 난즉사]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600355T.jpg)
![임상에 울고 웃는 바이오株…인벤티지랩·티움바이오 '방긋'[바이오 맥짚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800203T.jpg)
![美FDA인력 감축 칼바람 여파 '촉각'[제약·바이오 해외토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4/PS25041900112T.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충청서 압승 거둔 이재명…득표율 88.15%(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어머니, 아버지 저 장가갑니다”…‘결혼’ 김종민 끝내 눈물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충청서 압승 거둔 이재명…득표율 88.15%(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EU있는경제]투자만이 살 길…PE 규제 허물고 반등 노리는 英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동물실험 폐지 명암] 투심 쏠린 토모큐브, 빅파마가 주목하는 까닭①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