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바이오 산업 성장 키워드는 ‘M&A 확대’…"지분율 중심 경영 혁파해야"
- 최대주주 지분율 벗어나 이사회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해야
민간 투자 확대도 숙제…“지속 가능한 경영 위한 정책 나와야”

3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2’(이하 BIX) 기조세션에서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는 "향후 10년간 국내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M&A"라고 강조했다.
현재 창업한 바이오 기업의 수가 너무 많고, 회사의 기술 역량 또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만한 규모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바이오 기업의 수가 너무 많다. 보유 기술은 굉장히 쪼개져 있고, 기술의 사이즈는 글로벌 수출을 목표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바이오 기업은 대부분 상장했고, 임원은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시가총액도 상당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바이오 기업이 M&A를 확대하기 위해선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중심이 된 경영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평생 연구를 하다 바이오 기업을 창업한 대표가 100명에서 500명으로, 이어 1000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경영을 잘할 수 있겠냐"며 "대표가 경영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권의 개념을 바꿔야 경영 측면에서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분율 중심의 지배구조가 바이오 기업이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표준화된 지배구조가 국내 바이오 기업이 외부 투자를 지속해서 유치하는 데 효율적이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수립하는 한편, 바이오 기업이 장기간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롱-온리(Long-Only) 펀드가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연금이나 기금을 통해 전문성 있는 롱-온리 펀드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기조세션에 참석한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도 바이오 기업들이 이사회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자녀에게 지분을 상속하기 위해 M&A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고,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가 갖춰진다면 M&A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유망 산업의 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 규모가 작고 장기적인 투자도 필요한 분야의 기업이 성장하려면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중국에서는 하이테크 기업의 법인세가 15%지만 다른 기업의 법인세는 25%"라며 "국가의 미래 주력 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공매도 제한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오와 같은 미래 성장 산업을 키우기 위해 민간 투자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업이 중심이 돼 민간 주도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바이오 분야에 투자하는 비중은 GDP 대비 높은 수준이며, 이제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생명공학기술(BT)은 정부와 민간 투자 규모가 엇비슷하지만, 정보기술(IT) 분야는 민간 투자가 정부 투자보다 월등히 많다"고 했다. 최 선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BT 산업에 투자한 금액은 3조7000억원으로 IT 부문에 투자한 규모(3조5000억원)보다 많다. 정부가 지정한 6개 미래 기술(6T) 중 BT에만 투자비용의 20%가 사용된다. 다만 민간 투자 규모는 IT 산업에 투입된 금액이 BT 분야의 9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최 선임은 바이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필요하며, 기존 정책 또한 바이오 기업이 사업 규모를 키우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성은 세계 주요 50개 국가 중 중위권"이라며 "정책을 효율화하려면 공급 중심의 연구개발(R&D)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는 R&D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민간 시장에 없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 역할이 중요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공급 정책과 함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도 균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부처 간 협력도 강조했다. 최 선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장관 협의체나 회의 등을 통해 R&D부터 인허가 정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기구와 협회 중심의 민관 협의체나 위원회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선모은 기자 suns@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면봉 개수 → 오겜2 참가자 세기.. 최도전, 정직해서 재밌다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1/isp20251221000019.400.0.jpg)
![갓 잡은 갈치를 입속에... 현대판 ‘나는 자연인이다’ 준아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21/isp20251121000010.40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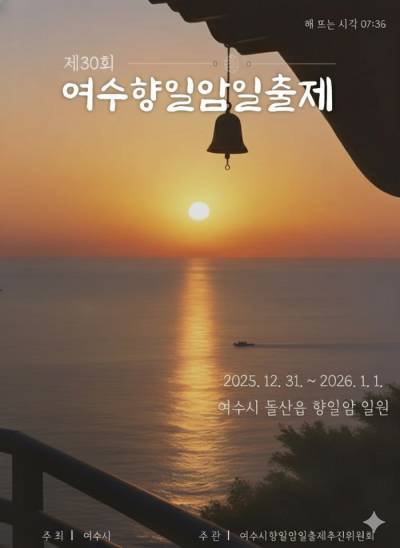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코인 혹한기’ 장기화?…세계 최대 비트코인 기업 충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 박나래, 공갈미수 혐의 이어 횡령혐의 추가 고소…전 매니저 ”허위 사실” 반박 [종합]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체코원전 손님 왔는데 수장없이 맞은 한수원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환헤지 둘러싼 딜레마…해외 투자 큰손들 “안 하면 위험, 하면 비용”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제테마, 태국 필러 1위 돌풍…"앨러간·갈더마와 함께 3대 명품 반열 등극"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