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단독] 카카오뱅크, 내년 경기도에 ‘서버 호텔’ 데이터센터 2곳 추가 운영
- 추가 센터는 액티브-액티브 방식 운영
내년엔 총 5곳…선제적 투자 나서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현재 경기도 인근에 데이터센터 2곳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한 계약을 협의 중에 있다. 카카오뱅크가 추가 운영할 데이터센터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으며 2024년 상반기에 1곳, 하반기에 1곳을 오픈할 예정이다.
컴퓨팅 장비를 모아놓은 건물이나 시설을 뜻하는 데이터센터는 ‘서버 호텔’(Server Hotel)이라고도 불린다. 이 곳에서는 카카오뱅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데이터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서울 상암에 주 전산센터, 경기도 성남시 야탑에 재난복구(DR)센터, 부산 강서구에 제3센터인 백업센터를 두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업계 최초로 데이터센터 3중화 체계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여기에 내년에 데이터센터 2곳이 더해지면 카카오뱅크는 총 5곳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추가 확보할 데이터센터 2곳은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상암 주센터 한 곳에서 받는 트래픽을 동시에 받아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액티브 센터에서 트래픽을 즉시 처리할 수 있다. 상암 주센터와 함께 운영 시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액티브 센터는 고객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운영되는 데이터센터를 뜻한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액티브-스탠바이’(Active-Standby) 방식이다. 상암 주센터가 액티브 형태로, 대기 중인 분당 센터는 스탠바이 형태로 운영된다. 주센터가 재해로 사용불가 상태가 되면 분당 센터가 트래픽을 처리하는 액티브 상태로 전환된다.
기존의 액티브-스탠바이 방식은 재해 발생 시 전환이 빠른 구조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데이터센터 내 다수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 데이터센터를 확보한다. 두 방식을 병렬적으로 상호보완해 운영하며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모든 일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거래 기록이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더욱 중요하다. 최근 클라우드·게임사 등에서도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금융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데이터센터 추가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10월 모회사인 카카오의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 또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계기가 됐다. 카카오뱅크는 당시에도 별도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해 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향후 안정성 강화, 고성능 병렬 연산용 서버인 GPU 서버·스토리지 등 고전력 장비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추가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섰다.
엄준식 카카오뱅크 최고정보책임자(CIO)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겪으면서 2중화, 3중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뱅크는 화재나 지진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비상 시나리오를 가동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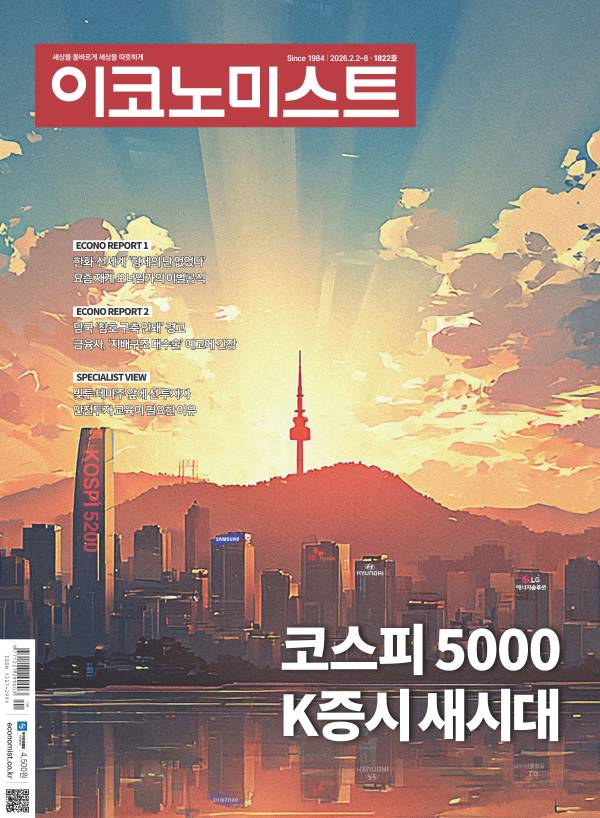
![썰풀이 최강자 ‘다인이공’...정주행 안 하면 후회할 걸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4/isp20260124000086.400.0.jpeg)
![‘중티’ 나는 남자와 ‘팩폭’ 날리는 여자, 시트콤보다 더 시트콤 같은 ‘여단오’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1/isp20260111000031.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단독] 장동주, 해킹 피해 ‘30억’ 버티는 중…“다시 시작하면 된다, 의지 강해” (직격인터뷰)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단독] 장동주, 해킹 피해 ‘30억’ 버티는 중…“다시 시작하면 된다, 의지 강해” (직격인터뷰)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코스피·코스닥 3%대 하락에도…개미들 9조원 이상 '순매수'했다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연초효과' 사라진 회사채…작년보다 주문액 3조 급감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디앤디파마텍·퍼스트바이오 공동 개발 뇌질환 신약 기술이전 가능성 '부각'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