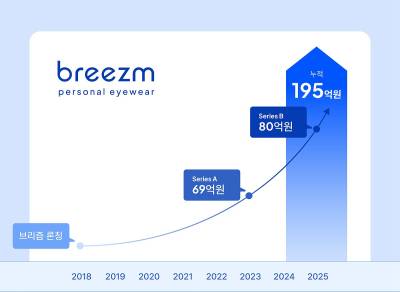'공익법인 상속세제' 검색결과
2 건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배경 중 하나로 상속세가 꼽힌다.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7일 재계에 따르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9일 별세한 만큼 6개월 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조 명예회장이 별세 직전 보유한 상장사 주식은 ▲효성티앤씨 39만2581주 ▲효성중공업 98만3730주 ▲효성화학 23만8707주 ▲ 효성첨단소재 46만2229주 ▲ 효성 213만5823주 등이다.별세 전후 2개월(총 4개월)간 평균 주식 평가액은 6950억원이며, 이를 토대로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3920억원이라고 한국CXO연구소가 추산했다.주식 평가액 6950억원에 할증 20%, 최고 세율 50%, 성실 납부 공제 3%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또 조 명예회장은 ▲갤럭시아디바이스 594만6218주 ▲공덕개발 3만4000주 ▲효성투자개발 400주 등 비상장사 3곳의 주식도 보유했다.여기에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금, 부동산, 기타 재산을 합하면 유족이 납부해야 할 실제 상속세 규모는 4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유언장에 남긴 상속 재산은 상장사 지분 기준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로 알려졌다.이를 최근 4개월간 평균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885억원 규모이며, 비상장사 지분 등을 포함하면 상속 재산이 1000억원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현행법상 상속세제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수준인 50%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상당하다.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 전액을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상속세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상속세를 내고 나면 실제 지분 상속분은 얼마 남지 않는데, 공익재단을 만들면 상속세를 감면받고 명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선친이 생전에 강조한 ‘산업보국’ 정신에 기여하겠다며 ‘단빛재단’ 설립에 공동상속인이자 형제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을 동의하고 협조하면 재단에 출연할 기금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상속세를 낸 재원보다 그 규모가 커지지 않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했다.또 9월 말까지 상속세 문제를 매끄럽게 정리하고, ‘효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사 지분을 처분하려면 형제간 협조가 필수다.조 전 부사장이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고 밝힌 점도 상속 관련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시간이 늦어지면 상속세에 대한 연체 가산금이 붙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며 “아무리 원수 같은 형제지간이어도 일단 상속세를 낼 때는 양보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라고 설명했다.
2024.07.07 13:01
3분 소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기업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경연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5%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주식면제비율을 미국과 같은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국제 자선단체인 CAF가 발표한 '2021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로 나타났다.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였다. 영국(33%), 미국(9%)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제한으로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사회가 수혜자인 공익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익사업의 축소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속세법이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를 제한해 기업승계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점도 보고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속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 의결권주식의 5% 초과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의결권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익법인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매년 말 초과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임 연구위원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갖춰져 있지도 않으면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를 사실상 봉쇄하는 현행 제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람직한지는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08.09 09:25
2분 소요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 예예, 미워할 수 없는 ‘킹’ 유발자 [IS인터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3/11/isp20250311000307.400.0.jpg)
![인터스텔라 한 편 뚝딱... 집에서 보는 ‘실감나는 우주’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3/16/isp20250316000120.40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