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말표구두약 창업주에서 된장 담그는 ‘머슴’으로 변신한 정두화 회장
- 말표구두약 창업주에서 된장 담그는 ‘머슴’으로 변신한 정두화 회장
거룻배 타고 들어와 집 짓고 콩밭 갈아 -농장이 꽤 넓은데요. 족히 2만평은 돼 보입니다. “콩밭만 2만5천평이에요. 농사에 바쁘니까 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수진원에서는 농장 안에 콩과 찹쌀을 심어 된장·간장·고추장을 만든다. 처음에는 친지와 지인들에게 재래식 된장을 선물하는 수준이었는데, 알음알음 찾는 사람이 늘어 단골이 꽤 된다. 옛 창경원에서 종자를 얻어와 토종닭도 기른다. 길마다 은행나무를 심어 가을에 은행 따는 일도 만만치 않다. 장독대에는 듬직한 항아리만 9백여개가 빼곡하게 도열해 있다. 항아리별로 ‘4334된7’ ‘4328간2’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이들은 각각 단기 4334년(2001년) 담근 7번째 된장독, 단기 4328년(1998년) 담근 간장독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간장은 최소 5년은 묵혀야 했어요. 새끼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세요. 아주 고소합니다. 간장 한 종지에 계란 한 알이면 누구든지 밥도둑이 됩니다.” 정회장은 옹골차게 재래식만 고집한다. “메주를 띄우고, 된장을 담그는 데 옛날 방식이 최고”라는 믿음 때문이다. “옛날부터 메주는 대청 시렁 위에 매달았습니다. 가장 햇볕이 잘 들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바람이 들고, 미생물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수유부터 국화까지 계절의 꽃가루가 찾아와야 합니다. 그 방식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정회장이 머슴 생활을 결심한 것은 꼭 33년 전이다. 군수품으로 시작한 ‘말표 구두약’이 빅히트를 치던 때였다. 고향인 경기도 양평 용문면 삼성리에 농사터를 잡았다. 지금이야 다리도 놓이고 인터넷 홈페이지(www.suzinwon.com)도 생겼지만, 당시는 개천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했던 시절이다. “뚝섬에서 나룻배를 만들어 한강을 따라 양평 삼성리까지 거슬러 왔어요. 여기에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콩을 심었습니다.” ‘농사’와 ‘수양’이라는 기본정신 아래 농장의 후계자는 ‘동국(東國)의 진인(眞人)’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수진원(修眞園)이라고 이름 지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입맛을 빼앗아 갔어요. 왜된장·왜간장이 아직도 우리 식탁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는 곧 그 민족의 정신인데…. 입맛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저는 이것을 찾고 싶습니다.” 국산구두약 1등 공신은 박태준 前 총리 정회장은 교육장·약수터·연구실·발효실·장독대로 옮겨가면서 꼼꼼히 된장과 간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왜 된장이 좋은가’라는 45분짜리 비디오까지 보고 나야 정회장의 ‘순서’가 끝난다. 이제는 기자가 질문을 던질 차례다. 화제를 구두약으로 옮겼다. 그는 “하도 옛날 얘기라서”라고 멋쩍게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국군 창설 초기에는 미8군에서 군수품을 보급받았어요. 그런데 군화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군과 국군이 똑같이 보급을 받는데 유독 우리 국군 군화만 일찍 떨어지는 거예요.” 미군 쪽에서 진상 조사에 나섰다. 나중에는 ‘너희들(미군)은 차를 많이 타고 국군은 주로 걸으니까 그렇다’는 변명 아닌 변명이 나오기도 했다. “알고 보니 구두약에 비결이 있더랍니다. 당시만 해도 국군에는 구두약이 보급되지 않았거든요. 군에서 갑자기 저를 불러들였습니다.” 당시 정회장은 잘 나가던 군납업자. 그런데 거래 품목이 달랐다. ‘태양사’라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군납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취급 품목이 두부나 콩나물 같은 식품이었던 것. 그러나 ‘명령’에는 따를 수밖에…. 명령만 내린다고 뚝딱 제품이 나올 수는 없는 일. 당시로선 기름을 적당히 굳혀서 왁스를 만드는 과정이 쉬운 공정이 아니었다. “포항제철 공사가 한창이던 시절 박태준 사장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모월 모시에 김포공항에 나가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구두약제조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는 겁니다.” ‘돈은 줄 수 있어도 기술은 줄 수 없다’던 일본 업체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게 된 것이다. 태양사는 그러고도 3년이 지나서야 국산 구두약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때가 67년 6월21일이다. 날개 돋친 듯 구두약이 팔려나간 것은 당연지사. 그렇다고 정회장이 이익을 독점한 것은 아니다. 태양사의 경쟁업체인 ‘캉가루’사에게 제조기술을 제공해 경쟁을 유도했다. 아무리 사양산업이라고 해도 말표구두약은 연간 2천5백만개가 팔리는 ‘밀리온 셀러’다. 92년에는 회사 이름을 말표산업으로 바꾸었다. 현재 회사는 정회장의 차남인 연수(52)씨가 이끌고 있다. “포철 공사를 하는 데 일본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었고, 공사를 발주하면서 박태준 사장이 이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일본 구두약 제조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말표구두약이 탄생한 1등 공신은 박태준 前 총리입니다. 저는 기껏해야 2등쯤 될까요.” -‘말표’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당시 구두 중에는 ‘고도방’이 최고였습니다. 가죽으로는 말가죽이에요. 그래서 ‘말가죽으로 만든 고도방’을 신었다고 하면 빗물도 안 새는 줄 알았어요. 고민 고민하다가 ‘말표 구두약이다’하고 무릎을 탁 쳤지요. “정두화 돈은 세지 마라” 구두약 얘기를 하는 동안 쌍화차가 한잔, 산수유차가 한잔 나왔다. 깨끗하게 깎은 밤알도 나왔다. 이번에는 정회장이 묻는다. “성공이 무엇이냐”고. 기자가 눈치없이 ‘뚝∼’ 하고 밤을 씹는 사이 벌써 “정직이 정답”이라는 대답이 나온다. 조흥은행 동대문 지점에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온다. ‘정두화가 입금한 돈은 세지 말라’는 것이다. 지폐 개수기가 없었던 시절, 은행에 입금을 하려면 출납계 직원이 일일이 손으로 지폐를 세어야 했다. 몇 줄을 서서 입금을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꽤 걸렸다. “하루는 지점장이 차를 한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점장실에 들어가 보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앞으로 정두화씨는 입금을 하려면 줄을 서지 말고 곧바로 창구에 넘겨도 된다는 것입니다. ‘1백장 묶음 다발에 도장 날인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튿날부터 정회장이 창구로 직행하니까 다른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다른 사람은 멀쩡히 줄을 섰는데 왜 정두화 돈만 그냥 받아주느냐”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3년 동안 은행과 거래했는데 한번도 액수가 틀린 적이 없고, 제 돈은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거든요.”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쌓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려서부터 ‘돈을 천하게 다루면 돈이 안 붙는다’는 가르침을 배웠어요. 사업을 하면서 저녁 아홉시만 되면 수금해 온 돈을 정리하는 것이 정해진 일과였습니다. 돈이 구겨져 있으면 인두로 다려서 폈고, 찢어져 있으면 창호지를 대 곱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얼굴 나오는 쪽을 앞으로 묶어서 다음날 은행으로 가져갔지요.” 외상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10일까지 대금을 갖다 준다고 약속하면 절대 10일까지 간 적이 없다. 언제나 8일·9일에 대금을 치렀다. 돈이 나가는 것도 철저하다. ‘왜, 어디에, 어떻게 쓰며 원 단위까지 계산이 맞아야’ 지출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돈 1천원도 그의 허락 없이는 절대 금고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농장에서 쓰던 농기계가 고장이 나 수리를 받았는데 비용이 2만원이 나왔다. 그러자 직원들이 쩔쩔 매면서 수리공에게 돈 대신 된장을 주더란다. 정회장한테 2만원 결재받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 이제야 머리카락 얘기를 묻는다. 정회장은 머리카락이 한올도 없는 ‘빡빡머리’다. -그리고 보니 머리카락이 한올도 없으시네요. “제가 19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하루 3시간만 자다 보니 그렇습니다. 한올 두올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눈썹도 없네요.” 이야기는 아파트살이에 대한 꾸짖음으로 정리된다. “아파트에는 된장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봐요. 세 가구가 모여서 1천평 땅을 사는 겁니다. 일요일마다 내려와 배추를 길러요. 집집마다 메주를 띄우고 된장을 담그는데, 이 일은 꼭 품앗이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언제라도 콩 한 가마니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집집마다 장독대 있는 세상이 제 꿈입니다.” 그러는 동안 부인인 장옥(78)씨는 된장 주문전화를 받고 있다. “일산시 굳…, 모, 닝… 힐? 아파트예요, 별 희한한 이름이 다 있네, 그래. 몇동 몇호예요? …. 안녕히 계슈.”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다. |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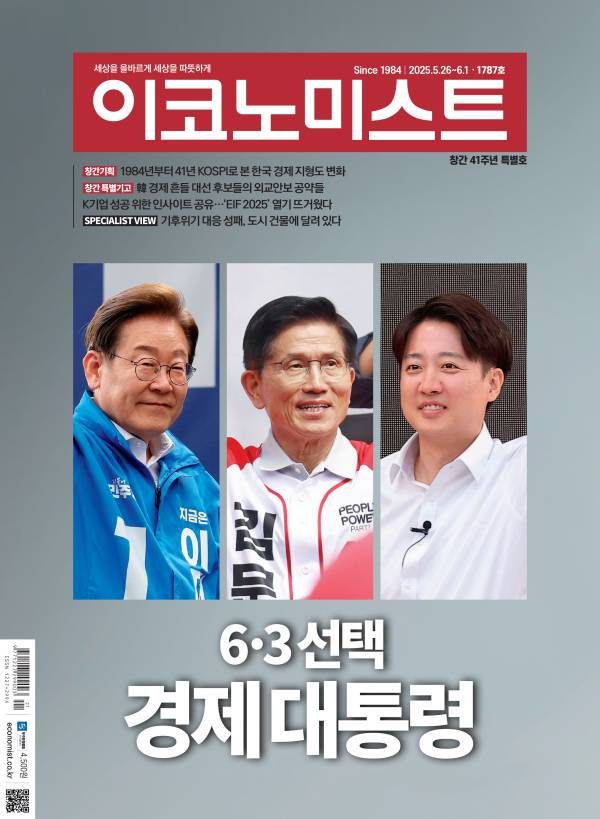
![집 속에 삶이 있다… 유튜버 ‘자취남’ 재밌네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07/isp20250507000059.400.0.jpg)
![약 5분 만에 인생꿀팁 알려드립니다 ‘비치키’ [김지혜의 ★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27/isp20250427000053.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대기만 2시간”…점심시간에도 이어진 사전투표 열기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일간스포츠
팜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 김준호♥김지민 '청첩장' 눈길 이유는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대기만 2시간”…점심시간에도 이어진 사전투표 열기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고금리 끝물…'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귀환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美의사들, 韓카티스템 수술 ‘열공’…메디포스트, 3상 준비 착착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