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y : Phnom Penh] 인도차이나의 마지막 도시
- [The City : Phnom Penh] 인도차이나의 마지막 도시
프놈펜은 진정한 의미의 마지막 인도차이나(옛 프랑스 식민지인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3개국) 도시라고 부를 만하다. 10년 전만 해도 지뢰로 다리를 잃은 걸인들이 도처에 있었다. 양팔로 작동하는 기구를 타고 관광객들을 쫓아다녔다. 소년들이 총을 갖고 다니는 난폭한 도시였다. 킬링 필드의 주범 폴 포트의 긴 그림자가 아직도 걷히지 않았으며 방문객이 부담 없이 돌아다니기 어려웠다. 달콤함도 있었지만 거기에 살기가 담겨 있었다.
이 캄보디아 수도는 아직도 본질적으로 여전히 거칠고 침체돼 있다. 주기적으로 “정화”가 실시되지만 다행스럽게도 효과가 없다. 공원과 길모퉁이에서는 휴대전화를 든 여성들이 밤새도록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향해 손짓한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거리의 반쯤 숨겨진 매음굴인 파리 호텔과 사쿠라는 아직도 찾는 이들이 많다. 아주 서서히 쇠퇴해 가는 프랑스풍 빌라들의 황토색과 암청색 벽들은 상단에 박아 넣은 유리조각들로 반짝인다. 뜻밖에도 사라진 정권들의 유산인 인생의 향락은 변함없는 듯하다.
톤레삽 강은 바다처럼 도시를 관통한다. 이 널따랗고 아름다운 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텔 르 로얄이 서 있다. 1929년에 문을 연 이 호텔은 프랑스 건축가이자 도시계획자 에르네스트 에브라르가 세웠다. 근대 프놈펜의 설계와 건설을 총지휘한 인물이다. 영국인 종군기자 존 스웨인이 인도차이나 전쟁의 참상을 묘사한 ‘시간의 강, 베트남 회고(River of Time: A Memoir of Vietnam)’에 그 호텔이 등장한다. 그는 크메르루주가 집권하기 직전인 1970년대 중반 자신이 머물던 시절의 모습을 그렸다. 그 호텔이 도시에서 “전쟁 전 시대의 한가한 듯한 매력”이 존재했던 유일한 곳이라고 그는 썼다. 최상층의 숙박료가 하루 5달러에 불과했지만 그렇게 싼 이유는 매일 로켓과 포탄이 날아다니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이었다. 전쟁의 위험은 도시를 자극적으로 만들었고 대학살은 섬뜩하게 만들었다.
나는 황혼 무렵의 모습이 좋다. 스마일 수퍼마켓 맞은 편에 자리잡은 음식점 카페 드 코랑의 야외 테이블에 앉는다. 이 작은 동네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치과가 밀집해 있는 듯하다. 북새통을 이룬 거리 위로 행복한 얼굴이 그려진 어금니 모양의 간판들이 매달렸다. 저녁 여섯 시는 바우(찐 빵), “자주빛 켈프(해조류) 롤”과 “청록색 채소 푸딩”을 “소금 탄 레몬수”와 함께 먹는 시간이다. 트위스트 롤과 미니 만두의 경이로운 맛에 누가 감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유리컵 위에 필터를 얹은 베트남식 아이스 커피가 나온다. 연유도 딸려 나온다. 그동안 시가를 한 대 피워 물고 바람 한 점 없는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연기를 지켜본다.
불빛이 하나둘씩 들어오지만 그 직전에 30분 정도 열대지방 특유의 어스름이 있다. 이때는 시멘트와 회반죽의 벽면과 너덜너덜해진 셔터가 갑자기 멀쩡해 보인다. 나는 인도차이나 은행 맞은편에 있는 식민지풍 건물의 음식점 ‘반’으로 들어가 14달러 정도를 내고 거위 간과 고급 스테이크 요리를 먹는다. 그 다음 전쟁 중 부상을 입은 맹인 안마사를 찾아갔다가 프렌드십 다리 건너편의 바로 향한다. 다리 위에서 강을 내려다보면 뱃머리가 길게 위로 솟구친 배들이 등불을 달고 메콩강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 도시에는 다른 곳이라면 오래 전에 헐렸을 유적들이 널려 있다. 큰 집들을 둘러싼 정원은 실제로 하나의 숲이다. 거리는 거리 같지 않고 우거진 식물들을 깎아내고 만든 통로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다 밤이 오면 거대한 망고 나무 냄새가 풍기는 불빛 없는 곳에서 혼자가 된다. 군중과 시장 속에서, 63번가 또는 51번가의 뜨거운 향락 속에서도 홀로 부족함이 없는 자유를 느낀다. 과거가 현재를 집어삼키지만 누가 의도한 건 아니다.
나는 오토바이 택시(motodop)를 타고 오토바이들의 강 속을 헤쳐나간다. 하지만 마찰은 없다. 모든 게 느리다. 이런 도시는 아편 굴처럼 필경 곧 과거의 유물이 되고 모든 곳이 브뤼셀이나 벤쿠버처럼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프놈펜은 과거 인도차이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흥미롭고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프라이버시와 유쾌한 관용, 공포와 용서의 특성을 지닌 곳이다. 매일 밤 약간의 걱정을 안고 문을 나서지만 몇 시간 뒤 포만감을 느끼며 돌아온다. 외부인이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 윙크할 만한 느낌을 초월하는, 상당히 불가사의한 포만감이다. 고통까지 모두 맛본 몽롱한 쾌락주의자, 그리고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방문객들의 연금술이다.
[필자의 소설 ‘용서받은 자(The Forgiven)’가 올 하반기에 출간된다. ]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버스 타다가 엉엉... 지예은 닮은 꼴 ‘쓰까르’, 매력 넘치네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26/isp20250826000291.400.0.jpg)
![‘채널주인부재중’으로 본 크리에이터 생존 전략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27/isp20250727000081.40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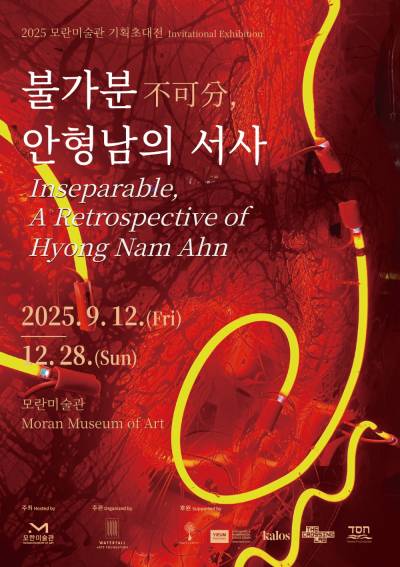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한동훈·양세찬이 사법연수원 동기? “맞아요, 그때도…” 농담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KBO 출범 44년 만 누적 관중 2억명 달성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美 석방 근로자들 귀환…LG엔솔 "한달 유급휴가 지원"(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혁신 기대했는데…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개점휴업'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보령과 맞손 큐라클 上, 수출호재 넥스트바이오 상승[바이오맥짚기]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