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국의 영광
무굴제국의 가장 유명한 유산은 남아시아 곳곳에 남아 있는 기념비적 건축물이다. 그 건축물들은 제국의 통치를 상징한다. 하지만 아름다운 세밀화(miniature paintings)가 가득한 ‘무굴 시대의 인도(Mughal India: Art, Culture and Empire)전’(런던 대영도서관에서 2013년 4월까지)에서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전시품은 옥으로 된 거북(a jade terrapin)이다.
1803년 벵골 공병단의 한 중위가 인도 알라하바드 지방의 수조(a water tank)에서 발견했다. 이 아름다운 작품은 그로부터 200년 전 자한기르 황제(자연 세계를 묘사한 예술을 적극 후원했다)를 위해서 제작된 듯하다.
자한기르(타지마할을 건립한 샤 자한이 그의 아들이다)는 16~17세기에 전성기를 누린 무굴 왕조에 대한 연구나 전시에서 주를 이루는 6명의 ‘위대한 무굴인(Great Mughals)’ 중 한명이다. 이번 전시회는 보기 드물게 무굴제국 시대 전반을 아우른다(spanning the entire arc of the empire).
사마르칸드에서 온 터키계 몽골인 왕자 바두르가 파니파트 전투에서 델리의 술탄을 정복한 1526년부터 1857년 폭동(영국인들에겐 인도 반란으로 알려졌다)으로 바하두르 샤 2세 황제가 버마(현 미얀마)로 망명하기까지 주요 황제 15명을 조명한다.
팽창주의 시대(an expansionist era)의 잔인한 전투와 참수(beheadings) 장면을 묘사한 그림부터 마지막 황제가 병상에 누운 채 재판(영국인들이 그를 반란 혐의로 기소했다)을 기다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다. 무굴 왕조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처럼 정치수완과 전쟁기술(화약과 코끼리를 이용한 전술 등이 포함됐다)을 겸비했을 뿐아니라 지식과 예술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다.
당시 네덜란드의 한 여행객은 2만4000권의 장서를 갖춘 아크바르 황제의 서재에 놀랐다고 말했다. 아크바르의 서재는 그의 무기고만큼이나 금전적 가치가 높았다(the Emperor Akbar’s library was worth as much in rupees as his armory).
전시회의 동영상 지도는 카불과 라호르부터 캘커타에 이르는 제국의 팽창 과정과 마지막 황제가 델리의 레드 포트(샤 자한이 세운 요새)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까지 몰락 과정을 보여준다. 대영도서관의 시각예술 부문 큐레이터 말리니 로이는 황실의 후원으로 꽃피운 문화를 통해 ‘권력의 흥망성쇄(rise and decline of power)’를 조명하고자했다고 말했다. 200여 점의 회화와 고문서가 전시됐다. 18세기 말 동인도 회사의 한 관리가 무굴 시대의 미술 작품을 모아 펴낸 ‘존슨 앨범’도 포함됐다.
그림을 곁들인 황제의 일대기를 뜻하는 나마(Nama)는 가장 소중한 자료다. 여기 실린 그림들은 흙과 광물 성분을 재료로 한 불투명한 수채화 물감(opaque watercolors)으로 그려졌다. 또 대여해 온 전시품들은 무굴시대의 미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 황제의 보석 박힌 금관이 한 예다. 이 금관은 벵골의 한 보병이 경매에서 사들인 뒤 빅토리아 영국 여왕에게 팔아 지금은 영국 왕실의 소유다.
보석으로 장식된 옥 파리채(flywhisk)에는 원래 공작 깃털이 달려 있었지만 전시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교한 장식의 물담뱃대로 담배를 피우는(smoking an improbably elaborate hookah) 바하두르 샤 2세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 속의 파리채에는 공작 깃털이 달려 있다.
정원(정원 가꾸기는 바부르 황제의 취미였다)처럼 설계된 이번 전시회의 중심부는 황제와 그들의 성격을 주제로 한 흥미로운 전시로 꾸며졌다. 가장자리에는 황궁의 생활부터 종교와 과학까지 다양한 주제의 전시품이 자리잡았다. 왕조의 창시자들은 칭기즈칸(몽고 제국의 시조)과 티무르(아시아 서쪽 절반을 정복한 몽고의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그림 속에 자신들이 티무르의 발 아래 있는 모습을 묘사했다. 바부르 황제의 아들 후마윤은 아끼던 서재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많은 황제가 치열한 황위 계승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perished in fierce succession wars). 눈이 멀거나 독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늘 아편과 와인에 취해서(addled by opium and wine) 지냈던 자한기르는 자연을 사랑했다. 그는 아버지인 아크바르 황제의 궁전에 필적하는 황궁을 알라하바드에 지었다. 제임스 1세 영국 국왕의 대사는 자한기르를 “매우 명랑하고 즐거운” 성격으로 묘사했다.
그로부터 100년 후 집권한 무함마드 샤는 쾌락을 사랑했다(pleasure lover). 그는 4주식 침대(a four-poster bed, 네 모서리에 기둥이 서 있고 덮개가 있는 형태) 위에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묘사됐다(pictured in flagrant coitus). 황제 주변의 인물들이 남긴 기록도 전시됐다. 후마윤의 시종 자우하르가 쓴 회고록과 어느 비둘기 애호가가 시적으로 표현한 비둘기 사육법(a pigeon-fancier’s poetic manual) 등이다.
아름다운 세밀화 중 ‘부인과 함께 홀리 축제를 즐기는 젊은 귀족’(1760)은 붉은색과 노란색의 감각적인 조화가 놀랍다. 또 ‘플라타너스 나무 위의 다람쥐’(1605~1608)는 ‘시대의 경이(Wonder of the Age)’로 불리는 미술가 아불 하산의 자연주의 걸작이다.
이슬람 왕조인 무굴 왕조는 힌두교도가 주류인 다종교 제국을 통치했다. 아크바르는 그런 특성에 합당한 전통을 세웠다. 종교적 관용(religious tolerance)을 원칙으로 종교 간 토론을 열고(holding interfaith debates) ‘보편적 종교(universal religion)’를 옹호했다. 아크바르 나마에 실린 그림 ‘살육의 중단을 명하는 아크바르’(1578)는 아크바르가 영적 깨달음을 얻어(in a moment of spiritual insight) 잔인한 사냥을 중단시키는 장면을 묘사했다.
하지만 그는 정치수완도 뛰어났다. 힌두 왕국인 라지푸트 왕국과 정략 결혼을 통해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비이슬람교도에게 물리던 인두세(a poll tax levied on non-Muslims) 지즈야는 아크바르 시대에 폐지됐다가 샤 자한의 아들 아우랑제브가 부활시켰다. 아우랑제브는 이슬람교의 우월성을 강조했으며 그가 즉위한 후 예술에 대한 후원도 시들해졌다.
회화와 문학 부문의 전시는 무굴제국의 예술이 페르시아와 고대 인도 문화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여준다. 후마윤은 페르시아의 미술가들을 황궁으로 데려왔고, 그의 아들 아크바르는 그들에게 공식 화원(artistic studio)을 마련해 줬다. 그곳에서 그들은 인도 아대륙 곳곳에서 온 무슬림 및 힌두 미술가와 서예가들을 지휘하며 작품을 제작했다.
함자 나마에 실린 회화 1400점은 15년간의 작업 끝에 1577년 완성됐는데 통일된 양식이 엿보인다. 원근법 등의 요소는 황궁을 염탐하러 왔던(who came to spy on the court) 포르투갈 예수회 회원 등 서양인들로부터 배웠다. 아크바르는 다른 이슬람 군주들과 달리 구상미술(figurative art)을 금지하지 않았다.
“화가가 생물체를 그릴 때는 자연히 창조주가 이룬 기적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he must ... perforce give thought to the miracle wrought by the Creator)”고 그는 말했다.
무굴제국을 세운 사람들은 터키어의 일종인 차가타이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궁정에서 사용한 공식언어는 페르시아어였다. 전시회에 소개된 고문서도 페르시아어로 돼 있다. 페르시아어로 된 책이 페르시아보다 무굴제국에서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었다. 아랍인들이 고대 그리스의 문헌을 전파해 유럽 르네상스의 원동력을 제공했듯이 무굴인들도 다양한 분야의 많은 서적을 번역했다. 1590년대에 아크바르는 터키어로 된 할아버지의 일대기 ‘바부르 나마’를 페르시아어로 번역하도록 명했다.
또 전쟁에 관한 서적 ‘람자 나마’의 집필을 추진했다. 힌두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페르시아어판이다. 힌두 철학의 근간인 우파니샤드는 산스크리트어 뿐 아니라 페르시아어로도 서양에 소개됐다.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교리를 하나로 합치고자 했던 아우랑제브의 명으로 이뤄진 일이다.
무굴제국의 쇠퇴기인 1739년 아프간의 침략자 나디르 샤는 무굴의 공작 왕관을 약탈하고 황제의 서재를 초토화시켰다. 미술가들은 무굴제국의 후원이 줄어들자 다른 후원자를 찾았다. 캘커타에 동물원을 세운 레이디 메리 임피가 한 예다. 그때부터 미술가들은 동물 묘사 등 좀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turning to more literal studies).
앞서 말한 옥 거북상이 발견된 시기에 무굴제국은 이미 쇠퇴해 황제가 레드 포트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무굴제국이 남긴 찬란한 문화는 여전히 눈부시게 빛난다(its splendor still dazzles).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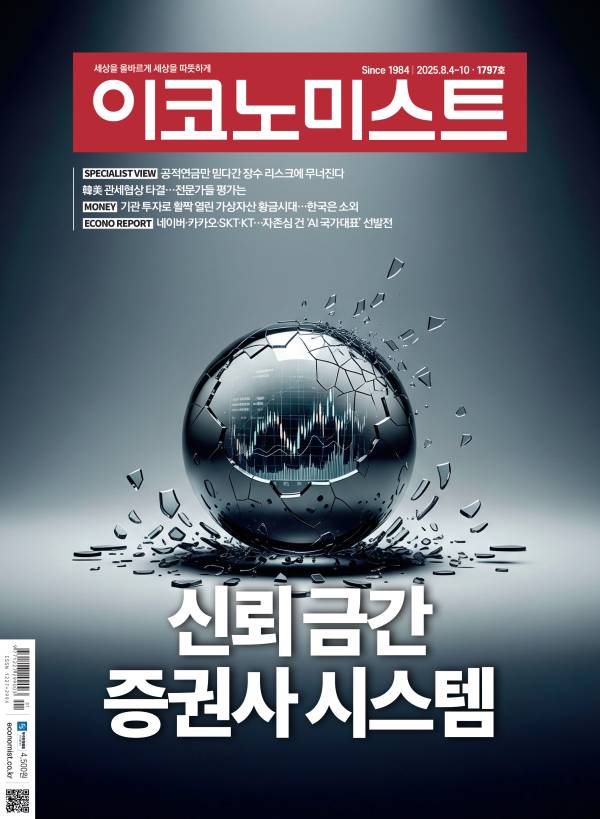
![‘채널주인부재중’으로 본 크리에이터 생존 전략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27/isp20250727000081.400.0.jpg)
![마지막에 한방이 있다 ‘흑백리뷰’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06/isp20250706000027.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라부부 50% 할인에 좋아했는데…'날벼락' 맞았다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팜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홍진경, 22년 만에 이혼…유튜브서 입장 밝힌다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고개 푹 김건희 "아무 것도 아닌 제가 심려끼쳐 죄송"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 홈플러스 4개점 인수 관련 대출 5800억, 만기 1년 연장 성공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주가에 막힌 HLB·HLB생명과학 합병, 재추진 가능성은?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