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학으로 읽는 경제원리] <라쇼몽>의 ‘기준점 효과’

명예냐 실리냐 고민하는 하급 무사
[라쇼몽]은 단편 소설의 귀재, 아쿠카가와 류노스케의 작품이다. 1915년 9월 [제국문학]에 처음 실렸다. 그러다 1년 반 뒤 단행본 [라쇼몽]에서 일부 고쳐지고, 3년 뒤 간행된 [코]에서 한 번 더 바뀐다. [라쇼몽]이 세계적인 작품으로 거듭난 것은 1950년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동명의 영화를 만들면서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류노스케의 단편 중 [덤불속]과 [라쇼몽]을 합쳐 영화 [라쇼몽]을 제작했다. 구로사와 아키라는 이 영화로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하급 무사는 하룻밤 눈 붙일 곳을 찾기위해 라쇼몽 계단을 올라갔다. 단청 밑에는 비바람을 피할 공간이 있다. 썩어가는 시체들이 있겠지만 당장 피할 밤의 추위가 더 걱정이다. 여기서 한 노파를 만난다. 그녀는 시체 가운데서 웅크리고 있다. 키가 작고 마른, 백발이 성성한, 원숭이 같이 생긴 음산한 노파다. 노파는 시체에서 머리카락을 뽑고 있다. 죽은자의 머리카락을 훔치다니. 하급 무사는 분노했다. 망자의 명복을 빌어주지 못할망정 망자의 체모를 훔치다니. 노파는 망자의 머라카락으로 가발을 만들려 한다. 노파의 변명은 있다. 죽은 여자는 생전에 뱀을 토막내 말린 것을 건어물이라고 속여판 나쁜 사람이다. 먹고살기 위해 그랬다. 노파 자신도 먹고살기 위해 망자의 머리카락을 훔친다고 했다. 이말은 하급 무사에게 전에 없는 용기를 줬다. 도둑이 될거냐 말꺼냐를 놓고 고민하던 그였다. 그는 도둑이 되기로 한다.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죽을 몸”이라며. 하급 무사는 노파의 옷을 벗겨서 도망간다.
무사에게는 명예가 중요하다. 그랬던 하급 무사가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계기는 노파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훔치는 노파에 비교하니 노파의 옷을 훔치는 자신의 도둑질은 그리 부도덕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노파도 마찬가지다. 죽은 여자가 생전에 나쁜 찬거리를 판 것에 비하면 자신의 범죄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람의 행동은 때로 ‘기준’에 따라 바뀐다.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가치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을 ‘기준점 효과(anchoring effect)’라고 부른다. 영문 그대로 ‘앵커링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정박효과’ ‘닻내림 효과’라고도 한다. 앵커링은 닻이다. 정박한 배는 닻을 내린 지점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는 모두 몇 개국일까. 트버스키와 카너먼은 이 질문을 실험자들에게 물었다. 한 실험자들에게는 먼저 숫자 ‘10’을 보여줬다. 또 다른 실험자는 ‘65’를 보여줬다. 그랬더니 ‘10’을 본 참가자들은 UN가맹국 중 아프리카국이 평균 25개국이라 답했다. ‘65’를 본 참가자들은 45개국이라고 답했다.
최초에 어떤 숫자를 봤느냐에 따라 실험자들의 답변이 달라졌다. 처음본 숫자들이 앵커, 즉 기준점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기준점 효과를 빈번히 활용하는 곳이 마케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희망소비자가격을 없앨 것을 제과 업체에 권고했다. 제과 업체들이 희망소비자가격을 부풀린 뒤 마치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희망소비자가격을 1500원 해놓고 700원에 팔면, 희망소비자가격을 1000원 해놨던 것보다 더 싸게 느껴진다. 백화점이나 가전매장, 혹은 가구매장에 가면 점원들은 고객들에게 통상 값비싼 제품을 먼저 보여준다. 그리고 저가 제품을 보여주는데 처음 고가 제품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값싼 제품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고가 제품에 소비자의 눈이 이미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형 평수에 사는 사람은 좀처럼 소형 평수로 옮기기 어렵고, 대형차를 탄 사람은 소형차를 못탄다는 것도 같은 이치다.
기준점 효과는 법정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통상 검사의 구형이 높으면 판사의 선고형량도 높고, 구형이 낮으면 선고형량도 낮다. 어느쪽이든 판사는 구형을 확 깎기 어려운데 검사가 합리적으로 구형을 했겠거니 하는 심리도 있을 테고, 너무 많이 낮추면 검찰 체면이 구겨지는 점도 고려했을 수도 있다. 혹은 튀는 판결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기준점은 투자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시작한 주가지수 혹은 매입한 주식가격을 기준점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2007년 주식 활황기 때 코스피 2100선을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 최근의 주가는 그다지 ’서프라이즈’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주가 1700정도에서 들어온 사람이면 상당한 과열로 느껴진다. 손실회피 성향이 작용하는 기준점도 첫 매입 시점이다. 1주에 10만원에 산 사람은 10만원으로 가격이 회복되기까지 주식을 잘 팔지못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 파괴하려면 기준점을 흔들어야
무사의 세계에 비해 노파의 세계는 도덕의 기준이 낮다. 사무라이는 기사도 정신을 지키기 위해 때로 목숨도 내놓지만 서민들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급 무사는 자신의 판단 수준을 노파의 세계로 낮췄더니 비로소 도둑질이 용인됐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 지식인 등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도덕률이 있다. 하지만 까봤더니 이들의 도덕심 수준이 일반인에도 못미치는 사람이 많아 실망을 주고 있다. 위장 전입, 탈세, 병역 회피,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의 판단 기준은 ‘공직자’기준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제대로 굴러간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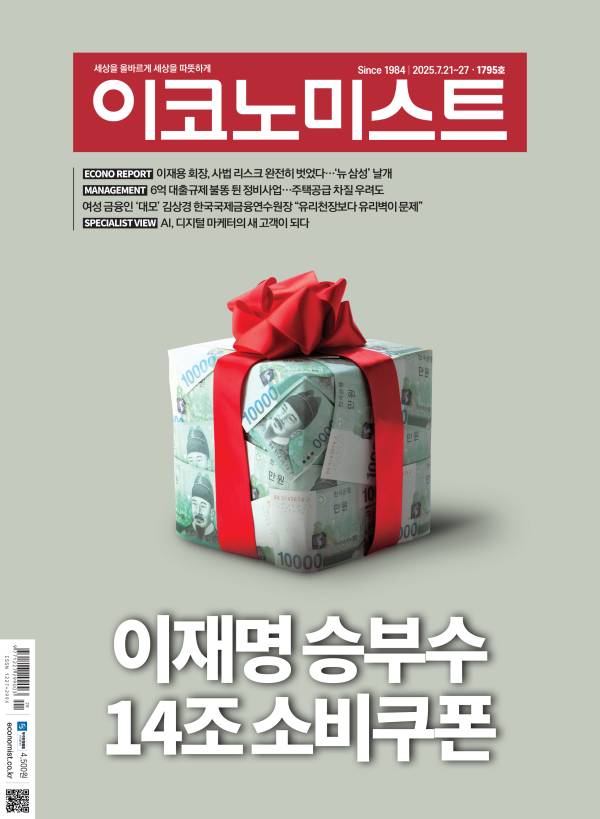
![마지막에 한방이 있다 ‘흑백리뷰’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06/isp20250706000027.400.0.jpg)
![장사+먹방+힐링..‘청춘만물트럭’은 낭만을 싣는다 [김지혜의 별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6/22/isp20250622000054.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역대급 실적' SK하이닉스, 상반기 PI 성과급 150% 지급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팜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국주, 日서 호화 생활? "나이에 맞는…"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갑질논란'에 무너진 '현역불패 신화'…검증 부담 커진 당정(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송현인베, IBK 출신 김영규 대표 내정…'혼돈기' 끝내고 재정비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에이프릴바이오, 하반기 SAFA 경쟁력 검증…추가 기술수출 이어지나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