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levision] 전쟁이 맺어준 불꽃 같은 커플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여러모로 오래 기억에 남는 인물이다. 아무도 흉내내지 못할 독특한 문체(inimitable writing), 비교적 젊은 나이인 61세에 엽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점, 큰 짐승 위주의 사냥(big-game hunting) 취미, 폭음(hard-drinking) 습관, 남자다움을 과시하는 성격(macho persona), 네 명의 부인. 하지만 여러 번 결혼한 유명인의 배우자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상대방의 인생에서 부차적인 존재(footnotes)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헨리 8세 전 영국 국왕과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생각해 보라. 테일러와 결혼한 여러 남성 중 리처트 버튼은 모두가 기억하지만 마이크 토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나 헤밍웨이의 네 부인 중 세 번째 부인이었던 마사 겔혼의 경우 그런 취급은 특히 부당하게(egregious) 보인다.
하지만 이제 겔혼은 헤밍웨이의 그늘에서 벗어나 마땅히 받아야 할 주목(her own well-deserved spotlight)을 받게 될 듯하다. HBO의 새 TV 영화 '헤밍웨이 & 겔혼(Hemingway & Gellhorn)'을 통해서다(오는 5월 28일 방영을 시작한다). 감독 필립 카우프먼['필사의 도전'(1983)]이 이 작품에서 묘사하듯 겔혼(니콜 키드먼)은 헤밍웨이(클라이브 오웬)의 네 부인 중 가장 도전적이고 흥미로울 뿐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unpleasant) 그의 가학증(sadism)에 유일하게 맞선 인물이었다. 그녀의 투지 만만한 독립성(gritty self-reliance)은 잦은 짜증(frequent tantrums)과 지극히 상처받기 쉬운 자존심(fatally fragile ego)을 지닌 헤밍웨이를 응석받이로 자란(overindulged) 남자아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사랑이요? 그런 걸 꼭 해야 하나요?” 영화 도입부에서 나이가 지긋한 겔혼이 인터뷰 도중 이렇게 말한다. 말 중간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경멸조로 던진 이 질문은 답이 이미 나와 있는(obviously rhetorical) 질문이다. “세상 돌아가는 일(what’s happening on the outside)”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거의 병적일 정도로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almost pathologically unromantic). “난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잠자리 파트너였을 것”이라고 그녀는 무덤덤하게(matter-of-factly) 말한다. “섹스는 그것을 원하는 남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다. 그래서 남자가 원할 때 응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to withhold it was like withholding bread)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 여성이 바로 우리가 글을 통해 아는 겔혼이다. 다작(prolific)이었던 그녀는 언제나 글쓰기에 목말라했고(impatient) 글을 쓸 때 늘 후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ever watchful of her own posterity).
하지만 겔혼을 연기한 키드먼은 나이 들어가는 이 맹렬 여기자의 또 다른 측면을 슬그머니 환기시킨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꽤 심각한(underlying and unsettling degree of) 상처와 좌절감이다. 겔혼은 그 세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군기자(war correspondent) 중 한명이다. 1930년대 스페인 내전부터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까지 수많은 전쟁을 취재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혁신적인 삶(her groundbreaking life)에 개인적으로 큰 희생이 따랐다는 사실을 잘 안다. 겔혼은 여자로서 끔직한 장면을 너무 많이 봤다. 그녀가 전쟁터에서 보내온 글에서 드러나듯 그녀는 이런 체험을 통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연민을 느끼는 특별한 능력(the legendary capacity to feel compassion for a complete stranger)을 얻은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친밀감(personal intimacy)을 포기한 대가로 얻어진 능력이다. 겔혼은 자신과 헤밍웨이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전쟁 중에는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세상에 전쟁이 없었을 때는 우리 스스로 둘 사이에 전쟁을 일으켰다(when there was no war, we made our own).” 두 사람이 공유했던 건 애정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심(a competitive passion)이었다. 이 경쟁심은 결국 둘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스페인 내전을 취재하는 동안 불륜관계(당시 헤밍웨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두 번째 부인 폴린 파이퍼와 결혼한 상태였다)를 맺은 두 사람은 1940년 결혼했다. 겔혼은 32세, 헤밍웨이는 41세였다. 결혼을 더 원했던 쪽은 헤밍웨이였고[겔혼은 처음부터 헤밍웨이에게 자신은 독신주의(has sworn off the institution)라고 말했다] 둘의 관계는 처음부터 불안했다(was volatile). 하지만 처음 몇 년 동안 두 사람은 말 그대로 'A급 커플'이었다. 그녀는 두려움을 모르는 야심찬 금발 미녀였고, 그는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체격에 자기도취에 빠진(narcissistic) 유명인사였다. 하지만 겔혼은 애정에 굶주린 남편을 어머니처럼 보살필(mothering her needy husband) 생각이 없었다. 또 헤밍웨이는 결혼생활보다 기자로서의 커리어를 더 중시하는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카우프먼은 이들 캐릭터에 매료됐다. 그리고 한사람이 하룻밤에 위스키와 와인 각 1병, 상당량의 압생트(a decent helping of absinthe)를 마셔도 알코올 중독 치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던 시절에 짙은 향수를 느꼈다. 하지만 낭만적인 기분에 치우치는 경향(overly romantic predilections)은 이 영화의 흠이기도 하다. 카우프먼은 향수를 강조하기라도 하듯 빛바랜 흑백 사진 같은 영상(sepia footage)을 자주 사용한다. 또 주인공들이 나이 든 후의 모습을 묘사하는 키드먼과 오웬의 연기에선 진정한 비애와 힘이 느껴지지만, 젊은 시절 주인공들의 모습은 마치 포토샵으로 수정한 듯 지나치게 매끈해 보인다(seem too airbrushed). 그들의 대화 역시 기존의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두 사람이 전선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겔혼이 헤밍웨이에게 속사포 같이 빠른 말투로 묻는다.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비결이 뭐죠(So how did you learn how to have fun in hell)?” “가족 휴가보다는 덜 끔찍하니까.” 헤밍웨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한다. 겔혼은 그의 재치있는 대답에 감탄해 얼빠진 듯(slack with admiration) 그를 바라본다.
쉽게 공감이 가지 않는 장면이다. 자신만만하고 두려움을 모르는(tough-cookie) 종군기자로 묘사되는 겔혼이 순진한 여학생처럼(school-girlishly) 헤밍웨이에게 홀딱 빠지다니(infatuated) 말이다. 사실 오래 가지 못할 이들의 관계(their unsustainable relationship)에 불꽃을 일으킨 건 헤밍웨이와의 관계에 종속되지 않으려는(not to be subsumed by relationship with him) 겔혼의 단호한 태도(determination)였다. 겔혼이 헤밍웨이를 사랑했을지는 몰라도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언제나 일이었다. 그녀가 탱크를 타고 스페인 시골을 달리는 장면에서 그녀의 내레이션(voice-over)이 흐른다. “난 늘 밤낮으로 일을 하고, 될수록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한층 더 실감나게 진행된다(is on firmer ground). 겔혼은 출장 중에 헤밍웨이가 프랑스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녀가 헤밍웨이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파파(papa, 팬들이 그에게 붙여준 애칭)'라는 별명에 딱 어울리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는 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holding court), 한 새로운 여인(장차 그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부인이 될 메리)이 이미 그에게 푹 빠져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인다. 헤밍웨이와 겔혼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두 사람의 파경은 어쩔 수 없는 결과였지만(even though the demise is inevitable) 여전히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영화의 마지막 배경은 아이다호주의 선밸리에 있는 헤밍웨이의 집이다. 여러 차례의 사고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데다(incapacitated) 오랜 음주로 심신이 약해진(debilitated) 헤밍웨이는 메리의 극성스러운 보살핌(overbearing ministrations)에 짜증을 낸다. “우린 파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집중해야 해요.” 메리가 이렇게 말하자 헤밍웨이는 자신의 몸 위에 얹힌 그녀의 손을 쳐서 밀어낸다(slaps her hand away). 그리고 잠시 후 그는 현관으로 걸어나가 생을 마감한다. 이 자살이 영화(어쩌면 헤밍웨이 인생)의 유일한 결말처럼 보이도록 만든 건 카우프먼의 능력이다.
한편 그 시간 겔혼은 바다 건너 런던의 자택에서 일에 열중하고 있다. 한 신문사와 전쟁(어떤 전쟁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취재에 관해 통화 중인 듯한 그녀는 “그럼 내 돈으로 가죠”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배낭을 메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러 홀로 길을 나선다. 그 일은 시인 로버트 번스가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성(man’s inhumanity to man)”이라고 말한 전쟁을 증언하는(to bear witness) 일이다. 보톡스 시술로 사람들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져가고 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어떤 현상에 모두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이 시대엔 겔혼 같은 영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녀는 미국 문화가 여전히 불편하게 여기는 듯한 한가지 사실을 몸소 입증했다. 모든 여성이 주어진 역할대로 자기희생적인 아내(self-sacrificing wife)나 자식을 애지중지하는 어머니(pampering mother)가 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번역 정경희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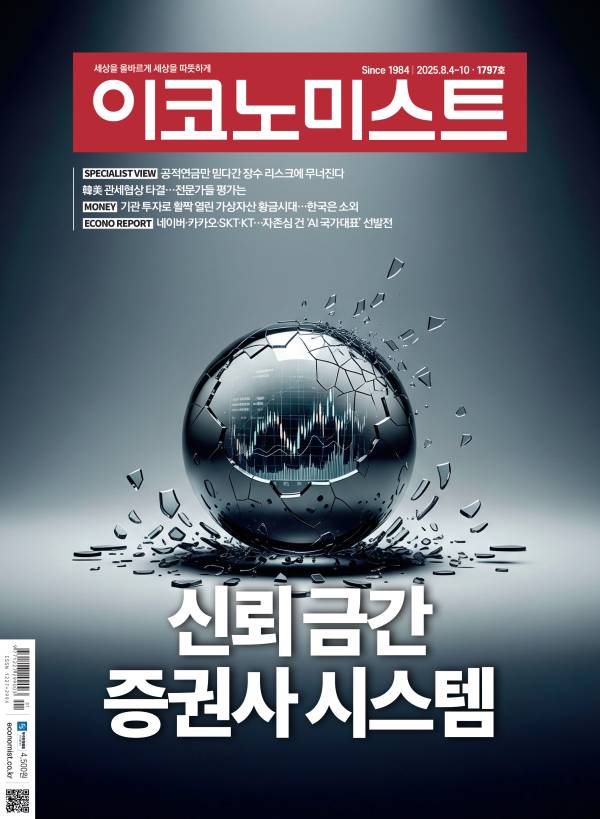
![‘채널주인부재중’으로 본 크리에이터 생존 전략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27/isp20250727000081.400.0.jpg)
![마지막에 한방이 있다 ‘흑백리뷰’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06/isp20250706000027.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물질특허 2040년까지 연장승인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시후 가정파탄 의혹…문자 속 女 해명글?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단독]전광훈 '자금줄' 의혹 선교카드…농협銀 "문제없다" 결론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애경산업 이달 본입찰…‘큰손’ 태광산업에 쏠리는 눈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대규모 기술수출에도 주가 원점 바이오벤처들…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