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맡기니 10% 더 비싸”…‘깜깜이’ 건축시장 바꾸는 스타트업
인테리어 시공업체 ‘아파트멘터리’…‘메뉴판식 정찰제’로 투명성 높여
건축물 시공 관리하는 ‘하우빌드’…볼트 하나까지 입찰 맡긴 뒤 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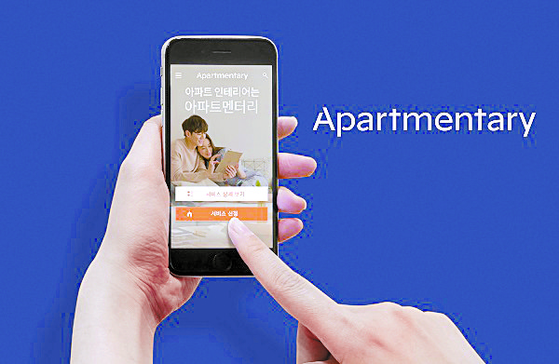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고급 차를 사는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가구가 늘었다. 이 업체 관계자가 “우리 경쟁상대는 수입차”라고 말하는 이유다. 덕분에 실적 전망도 낙관적이다. 이 업체는 올해 300억원 매출을 거둘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해보다 3배 많다.
인테리어업계에서 이 정도 실적은 이례적이다. 시공업체 수가 4만8648개(2019년 기준)에 이를 만큼 영세한 업체가 많다. 시공비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실내건축면허를 가진 업체는 7287곳뿐이다. 소비자들이 면허를 확인하고 리모델링을 맡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에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 무면허 업체가 시공했다가 하자가 나도 행정당국은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문제가 생기면 사업자등록을 내렸다가 다른 사업자명으로 다시 등록하는 경우도 적잖다.
이런 사정 때문에 소비자 불만도 꾸준히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년 3개월간 접수한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06건이었다. 이 중 2019년 접수한 건수는 426건이었다. 2017년 359건보다 18.7% 늘었다.
시장에서 개선 움직임이 없는 것은 공급자(시공사)가 자재 가격부터 공사 프로세스까지 관련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멘터리가 이런 시장 문제에 답을 내놨다.
레스토랑 메뉴판에서 음식을 고르듯 정찰제를 도입했다. 정식 명칭은 ‘프라이스 태그(가격표) 시스템’이다. 아파트 평(3.3㎡)형대별, 하위 브랜드별로 표준 가격대를 정하고, 상담을 거쳐 정확한 견적을 내는 식이다. 고객은 또 이 업체가 시공한 과거 포트폴리오들을 보고 ‘메뉴’를 고를 수 있다. 이 업체 앱 최상단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23평형) 시공 내역이 올라와 있다.
이 업체가 가격표 시스템을 정착시킨 비결은 데이터다. 지난 2016년 창업 후 6년간 서울지역 아파트 3만 곳과 시공 경험 1000여 건을 분석해 매뉴얼로 만들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찾는 분도 있지만, 고객의 70%는 기존 시공 사례를 중요하게 본다”며 “그러면 기존 사례를 분석해 아예 메뉴판처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정찰제는 이득이지만, 기존 시공사로선 손해일 수 있다. 시공내역 공개를 노하우 침해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불만을 다독인 비결은 ‘빠른 정산’이다. 매뉴얼대로 시공하기 때문에 계약 이행 여부를 두고 다툴 필요가 줄었고, 정산 속도는 빨라졌다. 아예 시공사와 공유하는 ERP(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정산과정을 자동화하기도 했다. “덕분에 신뢰 관계에 있는 파트너 시공사업자가 꾸준히 늘었다”고 이 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3000개 이르는 자재, 일일이 경쟁입찰
시공 PM(프로젝트 매니징)업체 ‘하우빌드’는 볼트 하나까지 공개입찰한 뒤 견적을 내는 서비스로 지난 1월 13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를 받았다. 유리 하나를 주문해도 수량부터 제품, 시공 방법까지 이 업체에서 결정한 뒤 입찰을 내는 식이다. 모든 시공사가 같은 조건에서 견적을 내기 때문에, 어느 시공사가 낸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쉽다. 이 업체 이승기 대표는 “건설사 평가 보고서와 공사비 분석 보고서를 함께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저가를 낸다고 해서 마냥 입찰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항목별로 입찰해 견적을 뽑아보니 뜻밖의 사실도 알게 됐다고 이 대표는 말한다. 건축주가 추천해 참여한 시공사가 평균 입찰가보다 보통 5~10% 비싸게 견적을 낸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 업계에서 ‘거품’ 없이 적절한 가격에 시공하기 어렵단 뜻이기도 하다.
이런 시장에서 하우빌드의 입찰 시스템을 좋게 봤을 리 없다. 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만 10년 넘게 걸렸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이 대표는 “2003년 시작했는데, 처음엔 공사비 총액만 공개하고 입찰업체별 순위를 매겼다”며 “그런데도 건설사에서 ‘왜 노하우를 공개하냐’며 협박 전화를 하곤 했다”고 그간 겪었던 어려움을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사실 건축주가 수량까지 정해주면 건설사 입장에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며 “이런 장점 때문에 요즘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인텔, 4분기 실적 예상보다 높아…시간외 주가 12%↑
2'오징어 게임2' 베일 벗다…이정재VS이병헌 뒤 임시완·조유리
3고려아연 유증 부정거래 조사 나선 금감원 “위법 확인 시 엄중 책임”
4“모발은 제2의 피부”…‘헤어 안티에이징’ 시대 열리나
5100만원 훌쩍 넘던 ‘AI 폰’, 갤럭시S24 FE부터 보급형 쏟아진다...가격은?
6尹 "김영선 해줘라 했다"...尹-명태균 통화음성 공개
7“갤럭시 기다려라, 아이폰 간다”...삼성vs애플, 드디어 시작된 ‘AI 폰’ 전쟁
8“아이콘 매치, 선수 섭외만 100억원…최고의 퀄리티만 생각했다”
9'탄핵 위기' 의협 회장 "과오 만회할 기회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