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터, 미스 아닌 ‘믹스’로

전통적인 호칭을 성중립적인 ‘믹스’로 대체하는 아이디어가 가장 최근에 생긴 변화로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미국 잡지 ‘싱글 페어런트(외부모)’ 1977년 호에 ‘믹스’를 처음 사용한 기록이 있다고 OED의 조너선 덴트 편집자가 같은 날 발표문에서 밝혔다.
“‘믹스’의 초기 주창자들은 성중립 원칙을 자신들의 핵심 문제로 여겼던 듯하다. 그리고 전통적인 호칭 ‘미스터’ ‘미세스’ ‘미스’가 주는 성차별의 느낌을 우회할 수 있는 호칭으로 봤다.” 덴트 편집자가 선데이 타임스에 한 말이다.
‘미즈’도 처음엔 생소했다
‘믹스 운동가(Mx Activist)’가 영국 내 그런 용례의 증거를 공개했다.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고용연금국, 왕립우체국(Royal Mail Group), 운전자·차량면허국의 문서 등이다. 이들은 성중립적인 ‘믹스’ 호칭의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한다(영국 용법에선 호칭 존칭 뒤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엄밀히 말해 이들은 트랜스젠더와 ‘양성탈피(genderqueer, 성별의 남녀 이분법적인 구분법에서 탈피한 성정체성 추구)’ 운동의 선봉에 나설 만한 조직은 아니다.
‘믹스’라는 호칭이 70년대 미국 잡지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OED가 발표하기 전에 ‘실제적인 양성성(Practical Androgyny)’이라는 사이트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뉴스그룹 중 구글 그룹스 유즈넷의 1982년 7월 기록 보관소에서 성중립적인 대명사에 관한 토론 중 한 사람이 ‘믹스’ 사용을 제안한 사례를 찾아냈다.
“주제: 더 많은 단어와 성별 뉴스그룹. 1982년 7월 9일 금요일 15:48:43 게시
이번 기회에 미스·미세스·미스터·미즈 같은 쓰레기들을 모두 치워버리자. 미스·미세스에서 기혼과 미혼을 통합한 미즈(Ms)로 바꾸는 데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았다. 어쨌든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하나의 포괄적인 호칭은 어떨까? 예를 들어 M 스미스, M 존스 등이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있다. 노골적으로 성차별적인 단어 무슈(Monsieur)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믹스 또는 먹스로 발음되는 Mx라는 호칭을 쓰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성별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가 더 안전하게 뿌리내리는 세상이 될 것이다.
믹스 존 엘드리지.”
‘믹스’의 역사, 그리고 주류 용법에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미즈’라는 호칭과 상당히 유사하다. ‘미즈’도 처음엔 거의 알려지지 않다가 수십 년 뒤에야 널리 사용됐다. 뉴욕타임스의 벤 짐머 기자가 호칭 ‘미즈’의 역사를 조사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서 발행되는 ‘선데이 리퍼블리컨’ 신문의 1901년 11월 10일자판 ‘독자편지(letter to the editor)’에서 최초로 사용된 기록을 찾아냈다. 편지에서 익명의 독자가 여성을 가리키는 호칭 ‘미스’와 ‘미세스’의 대안을 제시했다.
“영어에는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채우려 애쓰는 공백이 있다”고 그 익명의 선구자가 썼다. “누구에게나 어떤 여성의 신분을 몰라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경험이 있다. 미혼여성을 미세스로 부르거나 기혼여성에게 미스라는 열등한 호칭으로 모욕을 주는 것이나 오십보백보다. 하지만 여성의 신분을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다.”
그 독자는 이 같은 공백에 “혼인 여부에 관해 어떤 견해도 표현하지 않고 여성에 경의를 표하는 더 포괄적인 용어”를 제안했다.
짐머 기자에 따르면 ‘미즈’는 1901년 미국 안팎의 신문에서 널리 논의됐다. 하지만 1932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부상했다. 이번에도 뉴욕타임스에 보내는 독자편지 형식이었다. 편지는 “혼인 여부가 불분명한 여성”의 경우 ‘미즈(M’s)’나 ‘미스’로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1950년대 비즈니스 에티켓 관련서적과 문법학자들의 학문적 토론에서 줄기차게 논의된 끝에 1961년 실제적인 언어 용법의 토양에 뿌리내렸다. 22세의 민권 운동가 셰일라 마이클스가 룸메이트의 우편물에서 그 단어를 발견하고는 그 호칭의 대중화 캠페인을 펼치면서부터다. 그녀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페미니스트적인 호칭을 열렬히 옹호할 때 여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들었다. 스타이넘은 1971년 12월 ‘미즈’ 잡지 창간호를 냈다. 그 뒤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뤘다(하지만 뉴욕타임스는 1986년에야 ‘미즈’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짐머 기자가 겸연쩍은 듯 덧붙였다).
OED에 ‘믹스’를 수록한 데 대해 덴트 편집자는 선데이 타임스에 냉철한 분석을 제시했다. “영어가 사람들의 수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언어가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하기보다는 인간에게 맞춰야 한다.”
- 번역 차진우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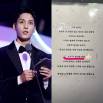





![약 5분 만에 인생꿀팁 알려드립니다 ‘비치키’ [김지혜의 ★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27/isp20250427000053.400.0.jpg)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 예예, 미워할 수 없는 ‘킹’ 유발자 [IS인터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3/11/isp20250311000307.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SKT "유심보호서비스, 폰 꺼져 있어도 복제폰 위험 막아"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팜이데일리
이데일리
故강지용 아내, 시댁 폭로 후 심경 고백...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3자 가상대결, 이재명 우위…한덕수 선호도↑[리얼미터]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DN솔루션즈 상장 철회는 시장 탓일까 과한 몸값 탓일까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바이오 월간 맥짚기]기업가치 평가 시험대 열렸다...주인공 누가될까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