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2022년 노벨상 수상 과학자들이 밝혀낸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과거 [한세희 테크&라이프]
- 노벨 물리학상…미지의 영역 양자역학 분석 3명의 과학자 선정
노벨 화학상 ‘클릭 화학’ 개척한 과학자에게 돌아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스반테 페보 소장, 누구도 예상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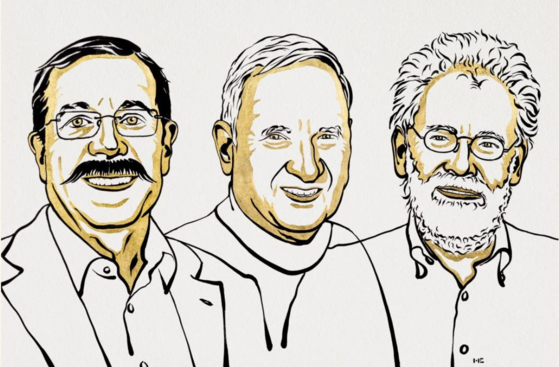
노벨상 과학 부문에서 한국인 수상자가 나오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 분명하다. 하지만 과학은 인류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지 메달 수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그 성과는 인류 전체에 기여한다. 그러니 노벨상 경쟁은 과학자들에게 맡겨 두고, 우리는 과연 노벨상을 받는 연구들은 무엇이며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과학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노벨상에 연연하는 것보다 더 노벨상 수상자 배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2년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다.
우주에 대한 이해 바꾼 양자역학 관련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
이들은 양자 역학의 핵심인 ‘양자 얽힘’이 실재임을 밝히고, 이를 양자통신과 양자컴퓨팅에 활용하는 길을 열었다.
양자 얽힘은 원자 이하 미시 세계에서, 떨어져 있는 두 입자 중 한쪽의 상태가 결정되는 순간 다른 쪽의 상태도 그에 맞춰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두 개의 상자 안에 각각 검은 공과 흰 공이 있고, 어느 공이 어느 상자에 있는지는 모른다 하자. 내가 검은 공을 뽑으면 친구는 흰 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은 처음부터 검은색 혹은 흰색을 띄고 있다. 상식적인 고전 물리의 세계이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선 상자 안에 든 공 중 무엇이 검정색이고 흰색인지 알 수 없다. 하나를 집어 드는 순간, 즉 관측하는 순간 공은 그제야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결정된다. 한쪽이 검은색으로 결정되는 순간, 다른 공도 흰색으로 정해진다.
양자 세계에서 공은 검을 수도, 흴 수도 있는 ‘중첩’ 상태에 있고, 입자들은 서로 ‘얽혀 있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쪽의 상태가 다른 쪽 상태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 직관과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는 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맸다.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그중 하나다. 그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며 양자역학을 못 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양자 얽힘을 설명할 수 있는, 알지 못하는 ‘숨은 변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물리학자 윌리엄 벨은 1960년대에 양자 얽힘을 설명하는 수식인 '벨 부등식'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숨은 변수가 있을 경우 관측값은 특정 값을 넘을 수 없다.
양자역학 논란에 종지부를 찍다
자일링어는 양자 얽힘을 활용,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을 보였다. 서로 얽혀 있는 입자 두 개 중 하나를 제3의 입자와 다시 얽어 정보를 전하는 ‘양자 전송’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양자통신과 양자컴퓨팅의 기반이 됐다. 자일링어의 수제자인 판젠웨이 중국과학원 교수는 지난해 4600㎞ 떨어진 곳에서 양자암호통신에 성공했다.
이들이 기여한 양자역학은 해킹할 수 없는 양자통신과 기존 컴퓨터의 한계를 넘는 양자컴퓨팅 등을 통해 새로운 세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상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었다. 우리는 고정된 불변의 우주가 아니라 확률이 지배하는 비상식적 공간에 살고 있다는 깨달음이다.
네안데르탈인 DNA 분석하고 신약 개발 새 장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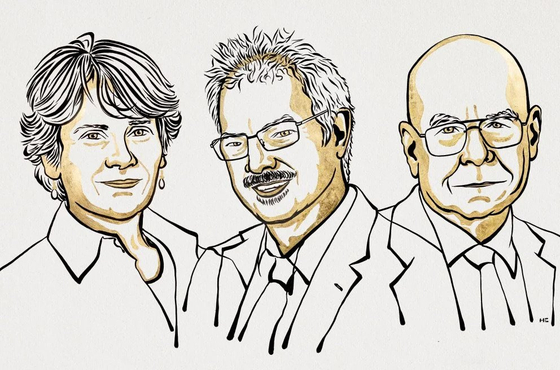
한 분자에 질소 3개가 결합된 아자이드를 붙이고 다른 분자에 알킨을 붙여 구리를 촉매로 쓰면 두 분자가 트리아졸이라는 안정적 구조를 형성하며 결합한다. 상온 상압 환경에서 적은 에너지로 안정적으로 결합한다. 신약이나 산업 공정을 위해 신물질을 만드는 것은 대부분 에너지 소모가 크고 부산물이 많이 생기는 비효율적 과정이다. 하지만 클릭 화학 덕분에 쉽고효율적으로 신물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샤플리스가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그와 멜달이 각자 구리 촉매를 사용한 아자이드-알킨 고리화첨가반응을 고안했다. 버토지는 몸에 해로운 구리를 쓰지 않고 이 기법을 생체 세포에 적용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클릭 방식으로 암세포에 형광 물질을 붙여 몸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은 채 암을 관찰 연구할 수 있게 했다. 클릭 화학은 신약 개발과 질병 연구의 새 장을 열었다.
올해 가장 뜻밖의 수상자는 생리의학상을 받은 스웨덴 출신 진화인류학자 스반테 페보 막스플랑크연구소 진화인류학연구소장이다.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는 언젠가 노벨상을 받으리란 것을 누구나 예상하던 사람들이었다. 반면 페보의 수상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인류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은 대부분 C형 간염 퇴치나 말라리아 치료법 개발과 같이 직관적 공로가 있는데, 페보의 연구는 그런 점을 찾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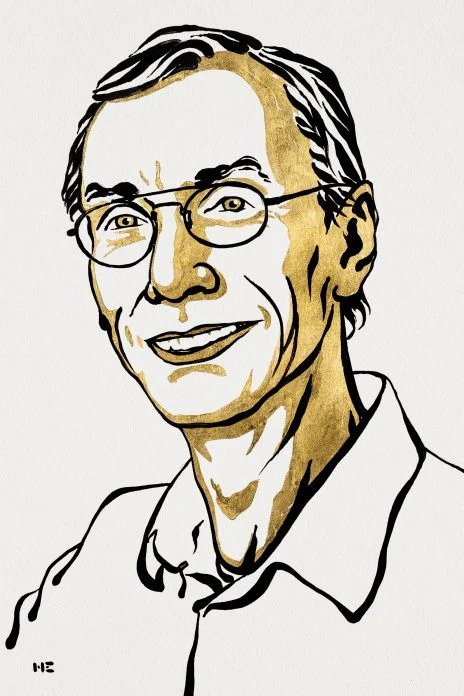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우주가 무엇인지를, 생리의학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화학상은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탐구한 과학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 필자는 전자신문 기자와 동아사이언스 데일리뉴스팀장을 지냈다. 기술과 사람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변해가는 모습을 항상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디지털과학 용어 사전]을 지었고, [네트워크전쟁]을 옮겼다.
한세희 IT 칼럼니스트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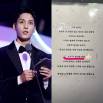





![약 5분 만에 인생꿀팁 알려드립니다 ‘비치키’ [김지혜의 ★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27/isp20250427000053.400.0.jpg)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 예예, 미워할 수 없는 ‘킹’ 유발자 [IS인터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3/11/isp20250311000307.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SKT "유심보호서비스, 폰 꺼져 있어도 복제폰 위험 막아"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팜이데일리
이데일리
故강지용 아내, 시댁 폭로 후 심경 고백...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3자 가상대결, 이재명 우위…한덕수 선호도↑[리얼미터]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DN솔루션즈 상장 철회는 시장 탓일까 과한 몸값 탓일까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바이오 월간 맥짚기]기업가치 평가 시험대 열렸다...주인공 누가될까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