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파리 올림픽이 '브랜드 올림픽'인 이유[허태윤의 브랜드 스토리]
- 글로벌 브랜드 각축장...스포츠 마케팅 중요성 대두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선수단은 구기 종목들의 대거 탈락으로 매우 소규모다. 그럼에도 파리 올림픽에서 연일 쏟아내는 우리나라 선수단의 승전보는 무더위로 인해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시원한 여름 밤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TV 시청률이 떨어지는 여름휴가 시즌의 공백을 파리 올림픽이 채우고 있고 관련 제품의 판매도 증대되고 있다. 스포츠 마케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셈이다.
브랜드 각축장 된 파리
프랑스 국립경제연구소(INSEE) 분석에 따르면 파리는 이번 올림픽으로 도시 가치를 180억 유로(약 27조)나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파리 시내 센강과 에펠탑을 배경으로 한 개회식은 전 세계 40억명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특히 주최 도시인 파리의 이미지답게 이번 올림픽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메달은 프랑스 보석 브랜드 '쇼메(Chaumet)가 디자인했다. 메달은 루이비통(Louisvuitton)이 만든 가죽 케이스에 담긴다. 선수들의 축배를 책임질 샴페인은 '모에 샹동(Moët & Chandon)'이다. 프랑스 대표팀의 개막식 의상은 '베를루티(Berluti)'가, 행사 후원에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이 나섰다. 성화 봉송 현장에서는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의 로고가 눈에 띈다. 모엣 헤네시·루이비통(LVMH) 소속 명품 브랜드의 잔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한국 브랜드로서 유일한 글로벌 파트너인 삼성전자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1만7000대의 '갤럭시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지급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직접 갤럭시 휴대폰을 활용해 셀카를 촬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박을 터뜨렸다. 이전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의 개인 휴대품 반입이 금지됐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시상 도우미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의 승리 순간을 갤럭시 폰으로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브랜드와 소비자, 그리고 선수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 혁신적 접근법을 선보였다.
이처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에게 파리 올림픽은 선수들의 유니폼과 장비에 브랜드를 노출하고 자신들의 기술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다. 또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기도 하다.
나이키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신발 제품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 4월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위한 '나이키 블루프린트 팩'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재는 케냐의 마라톤 영웅 엘리우드 킵초게와 영국의 단거리 선수 디나 애셔-스미스 등 유명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정보업체 스폰서유나이티드의 자료에 따르면,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육상 선수 중 64명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나이키를 홍보했으며, 푸마는 51명, 아디다스는 39명의 선수들이 각각 브랜드를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전쟁터 올림픽, 누가 효과적이었나
공식 후원사들은 거액을 투자한 만큼 확실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 스포츠마케팅 업계에 따르면, 올림픽과 같은 이벤트의 후원사는 공식 스폰서십 금액의 3배를 투자해야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기업들은 적은 투자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앰부시(Ambush) 마케팅'이다.
앰부시는 '매복'을 뜻하는 말로,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 후원업체가 아니면서도 광고 문구 등을 통해 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업체라는 인상을 줘 고객의 시선을 끌어 모으는 판촉 전략을 말한다.
엠부시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는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때 후지필름은 공식 후원사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거액을 지원했다. 당시 미국기업인 코닥은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스폰서십을 경쟁사인 일본회사에 뺏기게 된 셈이다.
이에 코닥은 매우 영리한 전략을 썼다. 공식 방송사인 ABC 방송의 스폰서가 된 것이다. 후지필름이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라도 사람들은 결국 TV를 통해 경기를 시청한다. 코닥은 당시 ‘ABC 게임방송의 자랑스러운 후원자(the proud sponsor of ABC’s broadcast of the games)’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올림픽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시청자들은 코닥이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라고 오인할 만했다. 이것이 바로 '앰부쉬 마케팅'의 시작이다.
이후 IOC는 공식 후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지 장치를 도입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02년 월드컵 때의 일이다. 공식 후원사 KT를 제치고 SK텔레콤이 "대한민국" 응원 구호와 ‘Be the Reds’ 붉은 악마 응원단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대~한민국" 박수는 바로 이때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스포츠 마케팅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거액의 스폰서십 없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스포츠의 열기를 자신의 브랜드와 연결시킬 수 있다.
올림픽 마케팅의 효과는 단기에 그치지 않는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 아디다스는 올림픽 이후 3년간 영국 내 매출이 연평균 12% 성장했다고 밝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 레노버는 올림픽 이후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1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림픽 마케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 맥도날드는 올림픽 이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로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는 쓴맛을 봤다. 이는 브랜드 가치와 올림픽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여준다.
스포츠 마케팅의 진정한 힘은 브랜드가 가진 이념적 속성과 스포츠 정신이 일치할 때 발휘된다. 올림픽이 추구하는 탁월함(Excellence), 우정(Friendship), 존중(Respect)의 가치와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조화를 이룬 브랜드들이 올림픽이라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도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허태윤 칼럼니스트(한신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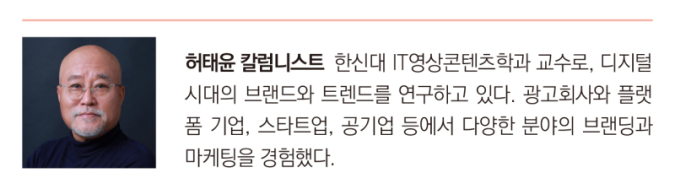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집에서 개가 제일 얌전”… 유튜브 ‘옥지네’가 보여주는 다정한 소란 [김지혜의 ★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2/isp20260222000072.400.0.jpg)
![썰풀이 최강자 ‘다인이공’...정주행 안 하면 후회할 걸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4/isp20260124000086.400.0.jpe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한국 계정 ‘공동현관 출입코드’ 포함…쿠팡, 대만 계정 20만개 유출 정황 확인(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팜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255억 풋옵션 승소’ 민희진, 오늘(25일) 긴급 기자회견…직접 등판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강경화 “美 301조 조사 가능성 예의주시…국익 최우선 대응”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하필 이럴 때 블루아울 쇼크…내달 출범 K-BDC ‘긴장'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상장 6개월차’ 지투지바이오에 기관투자자 1500억 베팅한 이유?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