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봉화, 자연의 시간에서 도시의 다른 가능성을 보다[김현아의 시티라이프]
- [지방의 시간을 기록한다]①
'연결의 상실'이야말로 지방 문제의 또 다른 본질

[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전 국회의원] 서울은 너무 완벽하다. 거대한 시스템이 매일 같은 속도로 회전하고, 정책의 나침반도, 언론의 헤드라인도 언제나 그곳을 향한다. 모든 데이터와 인덱스, 정부의 평가 기준조차 서울을 표준(Standard)으로 삼는다. R&D 투자, 고급 일자리, GTX와 같은 거대 교통 인프라는 오직 서울의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중력이 된다.
도시는 효율적으로 진화했지만, 그 속도는 인간의 숨결보다 빠르다. 거리에선 경쟁이 일상이 되고, 집은 자산이 됐으며, 시간은 통화처럼 거래된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평생 서울 중심의 도시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자문해왔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했던 것이다. 아니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같은 일들을 해왔다. 우리가 해오던 '효율적인' 주택 공급 정책과 '빠른' 도시계획이, 결국 천정부지로 솟은 서울의 집값과 그 눈부신 성장의 그림자 뒤로 텅 비어가는 지방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 '완벽한 시스템'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모든 답이 서울에 있다는 그 믿음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 심화, 일극화, 지방소멸을 가속시키고 있었다. 나는 다른 답을 찾기위해 요즘 지방 도시들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자료나 통계가 아닌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고 멈추는지를 그리고 한 도시의 속도를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서다.
103개의 정자, 봉화의 시간
첫번째 소개할 도시는 경북 봉화군이다. 이쯤이면 송이버섯 축제를 떠올릴 이곳 봉화에서 나는 엄청난 도시의 기록과 시간을 경험했다. 이 도시는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도로는 한산했고,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정말 조용했다. 상가는 이른 저녁이면 문을 닫고 북적이는 인파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서울과는 다른 밀도를 느꼈다. 서울의 시간이 '거래'와 '소비', '경쟁'으로 촘촘히 채워져 있다면, 봉화의 시간은 '자연의 순환'과 '사계의 흐름'으로 채워져 있었다.
봉화의 ‘정자문화생활관’은 이 도시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장소였다. 현지인에게 들으니 전국의 정자가 약 600여 개인데, 그 중 103개의 누정(樓亭)이 봉화에 있다고 했다. 하나의 군 단위 지역에 이 정도의 밀도라면, 단순히 유적의 숫자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공간에 새겨진 결과다. 생활관 마당에는 다섯 채의 정자가 복원돼 있었다. ‘정자’란 단순히 풍류를 즐기던 공간이 아니다. 그곳은 학문이 논의되고, 풍경이 철학이 되던 자리였다. 나는 문득 서울의 공간들을 떠올렸다. 서울의 카페가 '네트워킹'과 '정보 교환'을 위한 공간이고, 고층 빌딩의 회의실이 '성과'와 '결과'를 내기 위한 공간이라면, 봉화의 정자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머무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시간은 효율로 측정되지 않고, 그저 존재함으로 완성되는 것 같았다. 문뜩 이 너른 마당에서 요가나 명상 같은 프로그램이 열린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다. 그건 단지 체험행사가 아니라 ‘머무름’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는 일이 될 것이다.
봉화가 품은 시간의 결은 단순히 자연 속에 '머무름'에만 있지 않았다. 나는 닭실마을의 충효당(忠孝堂)과 그 앞에 선 낯선 이국의 동상을 마주했다. 이 동상은 놀랍게도 베트남 리 왕조의 시조인 '리 태조(Lý Thái Tổ)'였다. 800여 년 전, 왕조의 멸망을 피해 바다를 건넌 그의 후손(화산 이씨)이 머나먼 이곳 봉화에 정착했다. 그리고 이들은 망국의 후손으로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가 되었다. 충효당의 기둥에서 나는 7대손 이장발(李長發) 장군이 임진왜란을 맞아 남긴 시를 보았다. 스무 살의 청년은 충주 탄금대에서 자신들의 새 조국(朝鮮)을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모든 것을 효율과 개발의 논리로 덮어버리고 과거를 쉽게 지우는 서울의 시간 속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백 년을 이어온 '기억'과 '연대', '충효'의 시간이 이 조용한 고을의 또 다른 밀도를 증명하고 있었다.
'낙후'라는 편견, '느림'이라는 자산
봉화의 면적은 약 1,202㎢로 서울(약 605㎢)의 두 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2만8000여명(2024년 기준) 남짓이다. 서울의 한 개 동(洞) 인구와 비슷하다. 그나마 83%가 임야이다. 효율의 기준으로는 낙후지만, 삶의 밀도로 보면 가장 인간적인 도시였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후', '쇠퇴', '소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단어들은 '서울 중심의 효율성'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지방을 재단하는 편견의 언어다. 봉화의 '느림(Slowness)'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자원(Resource)'이다.
봉화에 닿기 전, 영주와 안동을 거쳤다. 영주는 한때 중앙선과 영동선이 교차하며 사람과 물자가 들끓던 '철의 도시'였다. 안동은 경북 북부의 행정과 문화를 아우르던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도시들에서 본 것은 '단절'과 '고립'의 흔적이었다. 수도권이 거미줄 같은 교통망(GTX 등)과 자본으로 서로 '연결'되며 거대한 시너지를 내는 동안, 지방은 서울로 향하는 '빨대(KTX, SRT)'만 꽂힌 채 지역 간의 수평적 연결은 쇠퇴했다.
KTX가 서울-안동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동안, 이 도시들 사이를 잇던 모세혈관 같은 지역 내 연결망은 오히려 끊어지고 말았다. 이 '연결의 상실'이야말로 내가 목격한 지방 문제의 또 다른 본질이다. 나는 지방의 소멸을 애도하지 않는다. 대신 그 다른 시간을 기록하려고 한다. 이번 ‘지방의 시간을 기록한다’ 첫 번째 여정은 봉화의 '정자'에서 '머무름의 철학'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앞서 스쳐 지나간 영주와 안동의 풍경에서 보았듯, 지방의 문제는 단순히 '느림'의 찬미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이 거대한 '연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동안, 지방은 왜 '단절'되고 '고립'되었는가? 이 연결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다음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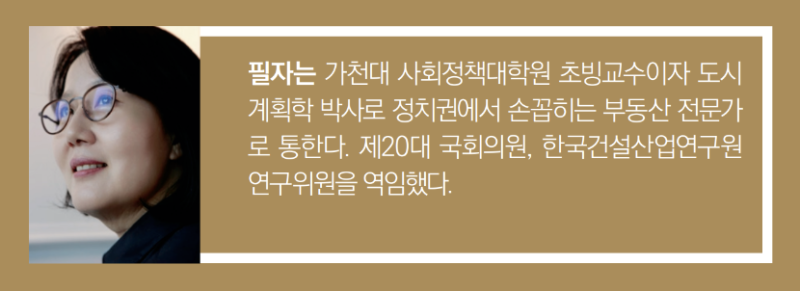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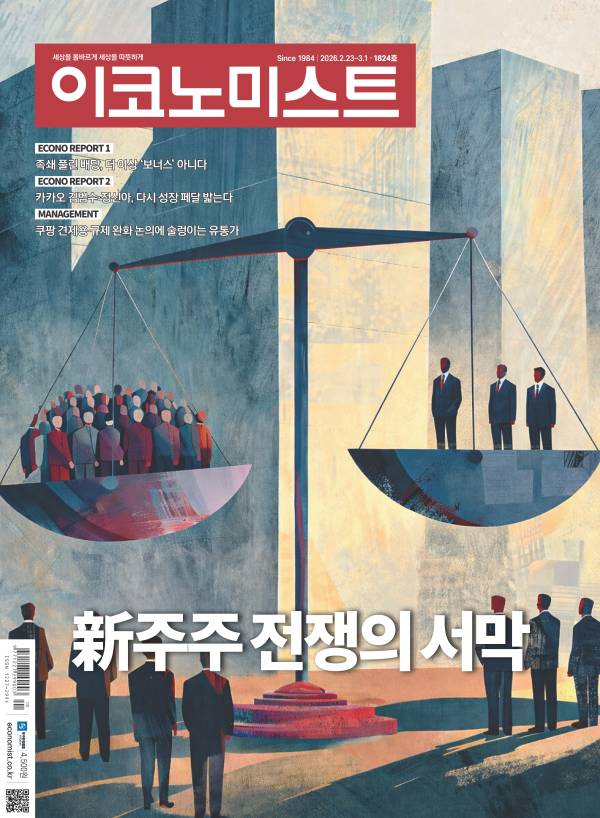
![“이 집에서 개가 제일 얌전”… 유튜브 ‘옥지네’가 보여주는 다정한 소란 [김지혜의 ★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2/isp20260222000072.400.0.jpg)
![썰풀이 최강자 ‘다인이공’...정주행 안 하면 후회할 걸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4/isp20260124000086.400.0.jpe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덴티스, 노르웨이 정부 주관 공공입찰 수주...루비스 수술등 180대 공급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단독] 아이들 민니, ‘원조마약떡집’으로 韓 영화 데뷔…라미란·고경표와 호흡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원 투자…'로봇·AI·수소' 혁신 거점 만든다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논란 떠안은 EQT의 결단…더존비즈온 공개매수로 리스크 털기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삼천당제약, 공시엔 없던 5.3조원...거래소 “계약서에도 없던 숫자”[only 이데일리]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