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agement - GM ‘노바’ 스페인어로 ‘가지 않는 차’
- Management - GM ‘노바’ 스페인어로 ‘가지 않는 차’

어떻게 단 몇 초 안에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광고 전략의 핵심이자 광고 디자이너의 영원한 고민거리다. 광고란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소비자의 오감을 최대한 자극해 뇌리에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날마다 수많은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광고를 봤다고 모두 기억하는 건 아니다. 상품명은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제품의 특징을 살리면서 바람직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상품명을 찾아내기 위해 기업의 브랜딩이나 마케팅 부서의 직원들은 오늘도 머리를 싸맨다.
고심 끝에 찾아낸 상품명과 제품의 특성이 맞아떨어져 성공을 거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이 나라에서는 좋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다를 건너가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기업이 해외시장을 공략할 때 해당국의 언어와 문화 환경을 미리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최악의 광고에 주는 ‘쉐비 노바’상1969년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쉐보레 플랫폼에서 생산한 새로운 소형차 모델에 신성(新星)이라는 뜻의 ‘노바(Nova)’란 이름을 붙이고 해외 수출의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GM의 기대에도 노바는 중남미 시장에서 참담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뒤늦게 조사를 해보니 이유는 어이없게도 모델명에 있었다. 알고 보니 ‘노바’는 스페인어로 ‘가지 않는다(doesn’t go)’는 뜻이었다. 가지 않는 차를 사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GM은 결국 그 차의 이름을 ‘카리브(Caribe)’로 바꾸었다.
GM의 ‘쉐비(쉐보레의 애칭) 노바’ 해프닝을 계기로 미국 마케팅 업계에서는 ‘쉐비 노바’ 상(賞)을 제정했다. 한마디로 최악의 광고상이다. 물론 실제 위원회가 있어 매년 기업을 선정해 상을 주는 건 아니다. 역대 쉐비 노바상 후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적인 이유식 제조회사 거버(Gerber)는 웃는 아기 얼굴이 심볼마크다. 거버의 창립자인 댄 거버는 회사 창립 이듬해인 1928년 건강하고 행복한 아기 얼굴 콘테스트를 열어 1등을 차지한 여자 아기의 얼굴 스케치를 모든 상품에 그려 넣었다. 이 아기 얼굴은 거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거버는 지난해 85세의 할머니가 된 최초의 우승자 앤터너 쿡을 찾아내 화제를 모았다.
거버는 아프리카에서 유아용 이유식을 판매하면서 세계 다른 나라에서 그러했듯 자사의 로고인 귀여운 아기 얼굴을 용기에 라벨로 부착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아프리카의 젊은 엄마들은 거버를 외면했다. 알고 보니 아프리카에서는 높은 문맹률 탓에 식품의 내용물을 글로 설명하지 않았다.
식품에 들어간 재료의 그림이나 사진을 용기나 포장박스에 그려 넣는 관습이 있었다. 아프리카 엄마들이 거버 이유식을 외면한 건 너무도 당연했다. 마치 외국인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한국 음식이 보신탕이나 번데기가 아니라 할머니 뼈다귀 감자탕이라는 농담처럼 말이다. 아기 머리로 만든 이유식은 할머니 뼈다귀로 만든 감자탕만큼 끔직한 음식이 아닐 수 없다.
미국 포드도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 브라질에서 자사의 소형 차종인 ‘핀토(Pinto)’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핀토는 스페인어로는 ‘조랑말(pony)’을 뜻한다. 그러나 포르투갈어로는 ‘크기가 작은 남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속어다. 포드는 이를 간과했다.
현대자동차가 ‘갤로퍼Galloper)’라는 이름으로 모델을 도입해 만든 미쓰비시 ‘파제로(Pajero)’는 1982년 출시돼 일본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SUV)라는 장르를 대중화시킨 주인공이다. 파제로는 아르헨티나 팜파스 지대에 사는 표범으로 미쓰비시는 표범이미지를 자동차 디자인 콘셉트에 적용하면서 작명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스페인어권에서 ‘파제로’는 속어로 ‘자위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다행히 미쓰비시는 중남미 수출 직전에 이를 알아내 중남미 수출 제품을 몬‘ 테로(Montero)’로 개명했다.
‘긴장을 풀자’가 ‘설사를 하자’ 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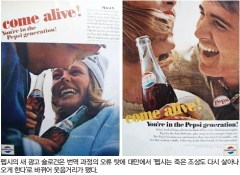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게 펩시의 ‘타이완 굴욕’이다. 펩시는 1960년대에 ‘Come alive with the Pepsi generation(펩시 세대와 함께 활력을 즐겨보세요)’이란 캠페인으로 재미를 봤지만 대만에서는 문제가 됐다.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generation’이 세대가 아닌 조상(ancestors)으로, ‘come alive’는 부활하다로 바뀌어 버렸다.
결국 펩시는 타이완에서 ‘펩시는 죽은 조상도 다시 살아나오게 한다(Pepsi will bring your ancestors back from the graves)’는 괴상망측한 캠페인을 내세운 꼴이라 웃음거리가 됐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KFC)의 ‘finger licking good(손가락을 핥을 정도로 맛 좋은)’이란 슬로건은 홍콩에서 ‘eat your fingers off(당신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먹는)’란 뜻으로 번역돼 홍콩 소비자들을 놀라게 했다. 펩시와 비슷한 사례다.
아메리칸 에어라인(AA)은 미국~멕시코 노선의 비즈니스 클래스 인테리어를 개선한 뒤 좌석이 모두 고급스러운 가죽시트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Fly in Leather’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나 멕시코 쪽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스페인어 캠페인은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Vuelo en Cuero’였는데 스페인어로 ‘en Cuero’는 ‘벌거벗은(in the nude)’이란 뜻의 속어였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은 기내에서는 벌거벗어야 한다는 해괴한 캠페인을 벌인 꼴이 됐다.
미국의 어느 항공회사는 보잉에서 제작한 747 여객기를 새로 도입하면서 여유 공간을 만들어 멋진 ‘랑데부 라운지’를 꾸몄다고 홍보했다. 랑데부(rendezvous)는 ‘만남’이란 뜻의 프랑스어이다. 대부분의 국제선 승객들은 선전처럼 넓고 쾌적한 랑데부 라운지에 만족했지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 사람들은 랑데부 라운지 이용을 꺼렸다. 포르투갈어로 랑데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성관계를 전제로 한 남녀의 은밀한 만남을 가리키는 속어로 통용되곤 한다.
미국 쿠어스(Coors)의 맥주 광고 캠페인은 ‘긴장을 풀자(Turn it loose)’다. 그런데 이를 스페인어로 번역했더니 ‘설사를 하자’라는 의미가 됐다. 당연히 쿠어스 맥주는 스페인어권에서 판매 부진에 시달렸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로 위의 크리에이터, ‘배달배’가 만든 K-배달 서사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9/25/isp20250925000152.400.0.jpg)
![비혼시대 역행하는 ‘종지부부’... 귀여운 움이, 유쾌한 입담은 ‘덤’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0/02/isp20251002000123.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성산일출봉 근처 수상한 벽돌이 ‘둥둥’…20kg 마약이었다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제동 근황 공개 “나 무시하냐” 발끈..왜?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세관 마약 수사팀’ 임은정·백해룡 충돌한 이유(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오일 Drive]사모펀드부터 디지털 자산까지…대체투자 ‘거점’ 만드는 두바이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의료AI 다크호스]"업무 효율·수익 동시에 UP"…와이즈AI, 성장 날갯짓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