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상위 1%…‘슈퍼 엘리트’의 최종 목적지는? [임성호의 입시지계]
-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문과 →이과, 이공계→의대, 의대→전공분야도 ‘쏠림현상 ’
외과·응급의학과 등 생명 직결 분야 미달…“국가 지원 필요”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지는 수학과목은 전체 30문제가 출제되고, 이중 22문제는 계열에 상관없이 공통문항이고, 배점은 100점 만점 중 74점이다. 나머지 8문제는 문과학생은 주로 확률과 통계, 이과학생은 미적분 또는 기하과목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
수학 응시 과목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과목으로 나뉘어 지지만, 성적 결과값은 수학이라는 과목명으로 통일되어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부여된다.
최상위 엘리트, 수능·내신 모두 ‘이과생이 독차지’
대학에서는 표준점수, 백분위를 주로 활용하고, 문과 지원자들은 대부분 확률과 통계, 이과 지원자들은 미적분 또는 기하과목 성적을 제출한다.
수학에서 30문제중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선택과목에 상관없이 공통문항 22문제를 미적분, 기하 학생들이 배점 74점중 약 20~30점 정도를 앞서기 때문에, 수학과목에서 전체 1등급 학생들을 줄을 세워놓을 경우 1등급 전체 학생 중 90% 이상 학생이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다.
결국 현재 통합수능 체제에서 수학과목에 절대적인 문이과 점수차가 발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수능에서는 이과 학생들이 1등급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문과학생들에 비해 크게 앞선 상황이다.
사실 국어 과목도 통합수능으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국어 1등급중 약 80% 정도가 이과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영어과목에서도 1등급의 약 60% 학생들은 이과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이과 학생들이 앞서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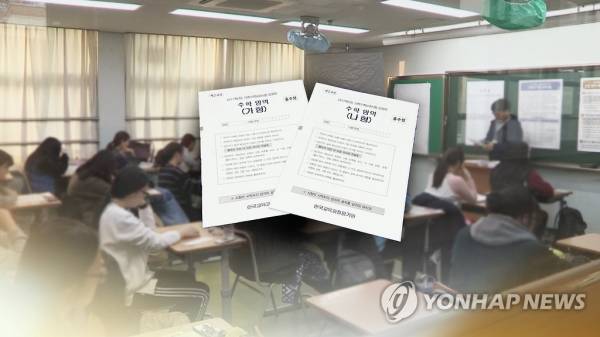
학교내에서도 문, 이과 통합 교과형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과 학생들이 내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즉 수능, 내신 모두에서 최상위권 엘리트학생들은 이과로 쏠려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서연고 수시 전형에 합격하고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간 학생 비율이 전체 합격생 대비 59.9%이다. 이중 자연계는 서연고 전체 합격생 중 69.5%가 서연고를 포기하고 타 대학으로 이동했다. 수시는 6번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군데 대학에 동시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수시에서 자연계를 합격하고도 156명 학생, 연세대 889명, 고려대 1345명이 등록을 포기하고 타 대학으로 이동했다. 서울대 자연계를 합격하고 타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의대로 진학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여기까지 상황으로 볼 때 최상위권 엘리트학생들은 우선 이과로, 이과중에서 이공계 학과보다는 의대로 진학하는 패턴이다.
재활의학·안과·정신과 등 비수술 분야 선호도 높아
그럼 의대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전문의 전공분야는 어떨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외과의사, 응급의료 분야 등 수술에 대한 위험과 부담이 따르는 핵심 분야로 진출할 지 아니면 수술에 대한 부담이 없고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로 가는지는 이미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에 최고 엘리트가 간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주요 수련병원 진료과별 모집결과 상황(2021년 기준)은 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모두 0.3~0.7대 1 정도 상황으로 미달이다. 상대적으로 재활의학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안과, 영상의학과 등은 모두 경쟁률이 높다.
모든 의료분야가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를 엘리트들이 기피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의료분야에서도 한쪽 분야로 쏠리는 현상은 국가가 나서서라도 새롭게 구도를 만들어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무원 처우도 나빠지면서 공무원 선호도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쩌면 고급인재들이 국가 행정분야에도 진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국가, 기업, 의료분야 등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책임과 잘못에 대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처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
그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업에서도 막강한 책임과 리스크를 안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최고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곧 더 나은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이 국가, 기업 모두 단순 사회 특권층에 대한 우대의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갓 잡은 갈치를 입속에... 현대판 ‘나는 자연인이다’ 준아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21/isp20251121000010.400.0.jpg)
![딱 1분… 숏폼 드라마계 다크호스 ‘야자캠프’를 아시나요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09/isp20251109000035.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마켓인] IPO 앞둔 무신사…10조 몸값 ‘격차 메우기’ 관건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 침묵 깬 박나래 “절차에 맡기겠다”…전 매니저들과 법적 공방 본격 예고 [종합]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정부 대책 쏟아져도 환율 고공행진…또 1480원 위협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美 백기사’ 확보한 고려아연…법적 공방 쟁점은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심운섭 그래피 대표 “글로벌서 러브콜 쇄도…내년 수익개선 본격화”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